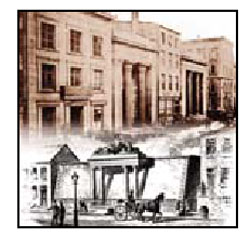|
상수도회사 설립방안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뉴욕의 지하수원이 오염되고 1798년에는 황열병에 시달렸던 터.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작 설립을 주도한 애런 버 뉴욕주 상원의원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1799년 4월17일, 주의회가 ‘맨해튼 상수도회사’를 인가할 때 그는 ‘주식투자나 차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조항 하나를 슬쩍 집어넣었다. 은행업 진출을 위한 위장전술이었다. 왜 ‘꼼수’를 썼을까. 대형 은행 설립은 금융을 장악하던 알렉산더 해밀튼 전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주의회의 인가 사항. 우회통로를 택한 셈이다. 해밀튼은 앙숙관계인 버가 은행업을 시작하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에 나섰다. 1800년 대선에서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표를 얻은 버는 대통령직을 꿈꿨지만 해밀튼의 방해로 부통령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맨해튼 상수도회사. 조악한 통나무 상수관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았다. 시민들은 불만이었으나 버는 아랑곳 없었다. 애초 목적이 돈놀이였으까.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 남짓하던 시절에 자본금 200만달러로 설립한 맨해튼 회사의 은행영업만큼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버 자신도 6만4,903달러어치의 주식을 챙겼다. 반면 금융 부문을 잠식 당한 해밀튼의 버에 대한 분노는 갈수록 깊어졌다. 두 사람의 악연은 끝내 권총 결투로 이어져 해밀튼은 버가 쏜 탄알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버 역시 결투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맨해튼 회사는 합병을 거듭하며 체이스맨해튼은행으로 자랐다. 맨해튼 회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2000년 체이스맨해튼과 JP모건의 합병으로 출범한 JP모건체이스은행의 유전자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