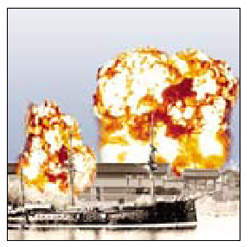|
[오늘의 경제소사/9월28일] 두모진해관(豆毛鎭海關) 권홍우 편집위원 땅을 치고 후회하던 조선이 묘안을 짜냈다. 일본에 개항하며 무관세 교역을 허용한 지 2년여.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조선은 1878년 9월28일(양력·음력 9월3일), 부산에 두모진해관(해관은 세관의 청국식 표기)을 세웠다. 세관을 설치했지만 무관세 조항에 묶여 있던 조선의 묘수는 조선인에게 국한된 과세. 일본과 거래하는 백성에게만 23~30%의 세금을 물렸다. 교역이 줄자 일본은 조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관청이 ‘내국인에 대한 과세에 일본이 상관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하자 일본 상인 200여명은 동래부에 난입, 칼을 휘두르는 난동까지 부렸다.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떴다. 특사를 파견하며 영국제 최신예 군함 비예(比叡)호를 부산 앞바다에 띄우는 무력시위도 벌였다. 조선 관리들이 버티자 일본군 100여명이 해관을 포위하고 주변을 함포로 두들겼다. 조선은 결국 손을 들었다. 12월19일 해관 폐지. 오히려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본 화폐 통용과 일본 상인의 내륙영업 허용, 개항 가속화를 약속하는 수모를 겪었다. 열강과 수교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관세주권을 일부 되찾은 조선은 1883년부터 해관을 속속 설치했으나 속 빈 강정이었다. 외국인 해관장의 임명권을 청국이 행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해관장급의 한달 봉급은 평균 350원(요즘 2,000만원 상당). 청일전쟁 전까지 관세수입 수백만원은 대부분 외국인 봉급과 운영비로 들어갔다. 조선은 1907년 해관의 명칭을 세관으로 바꾸는 등 근대화를 꾀했지만 끝내 망국을 피할 수 없었다. 관세 자주권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었던 두모진해관이 설치된지 129년이 흐른 오늘날, 한국은 또다시 관세와 싸우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조류 속에서 관세는 갈수록 낮아만 간다. 이번에는 오욕의 역사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입력시간 : 2007/09/2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