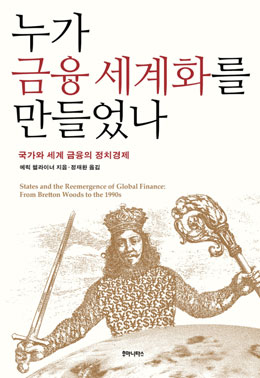홈
사회
사회일반
[책과세상] 금융 세계화는 패권국 이해관계의 산물
입력2010.07.16 18:02:09
수정
2010.07.16 18:02:09
'누가 금융 세계화를 만들었나'/에릭 헬라이너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금융시장의 지구화는 세계 경제에서 최근 이뤄진 가장 눈부신 발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시장 권력의 증대'와 통신ㆍ컴퓨터 같은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 1980~90년대 이후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하지만 캐나다 워털루대학 정치학교 교수인 저자는 이 같은 시각에 반대한다. "금융세계화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것이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책은 금융시장이 세계화하는 과정과 국가 권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1945년 이후 1990년대까지 규제 위주의 국제 금융질서가 자유주의적 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 저자는 전 지구적 금융시장이 뚜렷한 정치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국제 금융질서를 수립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항상 패권 국가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번성한 국제 금융시장은 1931년 금융위기 이후 30년 동안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 금융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 말 미미한 수준이었던 세계 외환 거래는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일일 거래량이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이 같은 대규모 금융 자유화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패권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미국은 금융 자유화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자본을 끌어옴으로써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었고 영국 역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과 달리 금융은 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로 여겨져 국내 정치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소수의 금융 엘리트가 중요한 결정을 손쉽게 내리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자는 덧붙였다. 금융 문제가 그만큼 비민주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책은 캐나다 현지에서 출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지금, 금융시장의 질서가 국가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저자의 지적이 예리하게 읽힌다. 1만5,000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