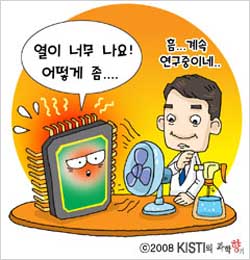반도체칩 발열량 ㎠당 100W넘어<br>트랜지스터 설계 바꿔 열차단 나서
요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다. 손안에 들어가는 크기지만 화상전화, 인터넷 단말기, TV, MP3플레이어, 카메라 등 없는 기능이 없다.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크게 높아진 덕택이다.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은 회로의 선폭을 수십나노미터(㎚) 수준까지 좁혔다.
하지만 회로의 선폭을 줄이는 데 걸림돌이 있다.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열의 양도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를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열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07년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열은 이미 제곱센티미터당 100W를 넘어섰고 오는 2010년쯤이면 지금의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0W 전구를 만져본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열이 발생하면 트랜지스터의 저항이 커져 집적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작동을 일으킨다. 때문에 집적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열을 잡아야 한다.
처음에는 공기와 접촉면을 늘리는 방식이 사용됐다. 하지만 칩의 집적도가 크게 높아진 펜티움 모델부터는 작은 선풍기(팬)를 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팬 때문에 컴퓨터를 켜면 ‘윙~’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생긴다.
애플이나 히타치는 부동액을 섞은 물을 순환시켜 중앙처리장치(CPU)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팬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음이 적다.
냉각수가 수밀리미터(㎜)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따라 돌며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앗아 밖으로 뽑아내는 ‘에어컨 방식’도 사용된다. 이 방식은 효율이 높기는 하지만 냉각수를 회전시키기 위해 모세관에 냉매를 집어넣는 펌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칩에 냉각수를 직접 뿌리는 다소 엽기적인 방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휼렛 패커드사(HP)가 지난 2002년 발표한 잉크젯 프린터 노즐로 칩에 직접 물을 뿌리는 ‘샤워식 냉각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아예 열의 발생을 줄이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트랜지스터의 설계를 바꿔 전자의 움직임을 더 확실하게 차단하자는 시도인데 ‘2중 게이트’와 ‘전면 게이트’ 설계가 대표적이다.
정보통신기기 수요가 지속되는 한 과학자와 열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