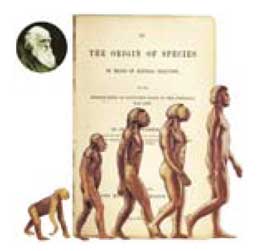|
1859년 11월24일, 런던이 발칵 뒤집혔다. 진원지는 이날 출간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다윈은 이 책에 젊음을 바쳤다. 만 22세에 영국해군 조사선 '비글호'에 승선한 이래 4년10개월의 항해를 포함해 28년간 끝없는 보완과정을 거쳐 내놓은 것이 진화론이다. 런던이 뒤집힌 것은 종교계의 반발 때문.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은 과학의 이름을 빌린 이단이었을 뿐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무수한 논란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벌이며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진화론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의 논리는 인종학과 우생학 연구로 이어져 히틀러라는 변종도 낳았다. 흑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도 인종주의의 벽을 역으로 넘은 진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사회주의 몰락을 지켜보며 '단순한 냉전의 종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전환의 마침표'라고 말했다.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를 두고 '자본주의 위기론'과 경제의 새로운 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론은 출발점부터 경제와 불가불의 관계다. 다윈은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적자생존의 개념을 얻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진화론은 시대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명으로 하루같이 세계가 변하는 시대에 나왔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전신과 탈 것의 속도경쟁이 펼쳐지고 일본이 서구문물을 신생아처럼 빨아들이던 당시,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세도정치의 전횡이 한창이었다. 진화론 출간 150주년을 맞은 오늘날에도 세계는 진화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