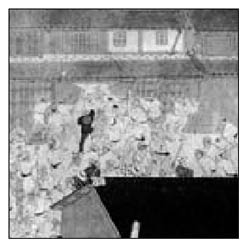|
1918년 7월22일, 일본 도야마(富山)현의 우오조(魚津)항. 선박 이부키마루(伊吹丸)에 홋카이도(北海道)로 내갈 쌀을 실으려 할 때 주부 300여명이 몰려나왔다. 주부들은 선적을 중단하고 쌀을 주민들에게 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던 일본인들이 왜 소동을 일으켰을까. 물가고 탓이다. 1차대전 기간 내내 한섬(150㎏)당 10엔이라는 가격을 유지해온 쌀 값이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해 6월 20엔, 7월 들어서는 30엔으로 뛰자 눌러왔던 불만이 터졌다. 쌀 값이 오른 이유는 수요 증가와 투기. 전쟁특수에 따른 호황으로 쌀 소비는 느는 데 비해 농가 인구는 줄어 수급에 변화가 생겼다. 공산혁명의 파급을 막기 위한 시베리아 출병으로 쌀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쌀을 매점매석한 미곡상들의 투기도 물가고를 부추겼다. 우오조항 주부들의 봉기는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해산됐지만 불씨가 일본 전역으로 번지며 9월 초까지 연인원 200만명이 참여하는 ‘잇키(一揆ㆍ민중봉기)’로 커졌다. 찬 바람이 불며 봉기는 가라앉았지만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당장 내각이 사퇴하고 일본 최초로 정당내각제가 선보였다. 민주주의가 반짝했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도 열렸다. 일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때부터다. 보도통제에 맞서 쌀 소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아사이(朝日)신문은 정론지로서 명성을 굳혔다.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조선. 쌀 부족 타개를 위해 일본은 조선에서 산미증식에 적극 나섰다. 덕분에 쌀 생산이 배증했지만 조선인 1인당 미곡 섭취량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증산분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남의 것을 제 것으로 여기는 일본인들의 습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