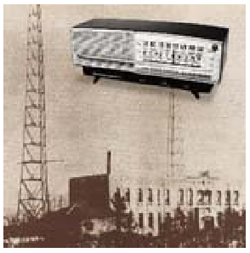|
[오늘의 경제소사/2월16일] 경성방송국 권홍우 편집위원 1927년 1월16일 오후1시. ‘제이 오 디 케이…. 여기는 경성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순간이다. 1920년 미국 라디오 정규방송 이후 7년 만이다. 콜사인(방송 호출부호) ‘JODK’는 ‘일본의 네번째 방송국(도쿄 AK, 오사카 BK, 나고야 CK)’이라는 뜻. 방송도 주로 일본어로 진행됐다. 라디오도 적었다. 등록 대수라야 고작 1,440여대. 비싼 탓이다. 보통제품이라도 40원대. 고급품은 1,000원이 넘었다. 방송국 기술직 신원사원의 월급이 2원이던 시절, 라디오는 부의 상징이었다. 청취료와 부속 교환에도 월 4원이 들어갔다. 대문에 ‘청취허가장’이 붙어야 부자로 행세하는 풍토도 생겼다. 방송사고도 흔하게 일어났다. 1928년 새해를 꾀꼬리울음으로 알리겠다던 기획은 세 마리 꾀꼬리가 침묵을 지키는 통에 30분간 침묵 방송으로 나갔다. 예능 프로그램의 주역인 기생들이 출연을 거부한 적도 있다. 일본 기생의 절반인 출연료가 문제였다. 최대 난제는 재정난. 월 5,000원인 청취료 수입으로는 제작비용 1만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해결방안은 조선인 청취자 확대. 조선어 전용인 제2방송이 1933년 시작되고서야 경성방송국은 적자를 줄일 수 있었다. 광복 전까지는 주요 도시에 16개 방송국이 생겼다. 라디오 가격도 10원대로 떨어졌다. 광복을 맞아 중앙방송국으로 거듭난 경성방송국은 개편과 통폐합을 거쳐 오늘날 한국방송(KBS)에 이르고 있다. 첫 방송전파 송출 80년, 식민지 지배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의 방송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송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다. 당장의 경쟁력이자 미래의 달러박스다. 입력시간 : 2007/02/15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