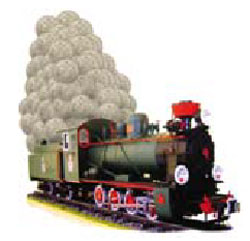|
공포가 씻은 듯이 가셨다. 도산 위기에 몰렸던 은행들이 정상영업하고 급전을 요구하던 기업은 대출신청서를 접었다. 1857년 12월12일, 자유도시 함부르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시에 불안 요인을 제거한 요인은 ‘돈의 홍수’. 은화(銀貨)를 가득 적재한 기차가 들어와 돈을 풀자 경색도 풀렸다. 운임을 받지 못한 화물선주들의 태업으로 기능이 정지됐던 항구도 제대로 돌아갔다. 돈이 궁할 때 ‘함부르크 은화열차는 언제 오는가’라는 관용구 표현도 생겼다. 독일에서 가장 잘살던 함부르크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은 항구도시였기 때문. 1857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공황이 단시일 내에 런던과 파리는 물론 북유럽과 남미ㆍ아프리카까지 파급됐을 때 항구인 함부르크가 독일에서는 가장 먼저 매를 맞았다. 함부르크 의회는 1,500만마르크의 차입을 결정했으나 예상과 달리 빌려준다는 곳이 없었다. 믿었던 프로이센마저 대출을 꺼려 연쇄도산의 공포가 덮친 순간 기대하지도 않았던 오스트리아가 부족한 만큼의 은화를 실은 열차를 보냈다. 경쟁 상대인 프로이센을 견제하려는 오스트리아의 대출은 함부르크의 위기뿐 아니라 ‘전세계가 공유한 최초의 위기’였다는 1857년 공황의 확산을 막아냈다. 함부르크가 프로이센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판단이 뜻밖에 ‘돈의 홍수’를 일으키고 위기를 잠재운 셈이다. 150년 전에 발생한 국제금융거래는 오늘날 더욱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국가 간 통화협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까지 수단도 다양해졌다. 변치 않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다. 경제정책 변경을 강요 받는 등 대가도 비싸다. 은화열차는 결코 공짜로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