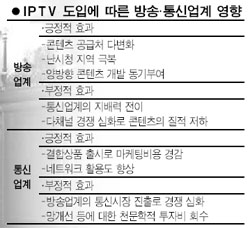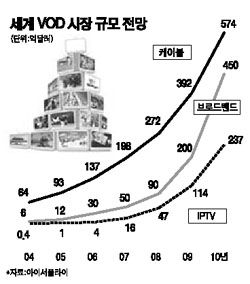"케이블TV와 별 차이 없다" 소비자 외면<br>美케이블 6,500만가구 가입·IPTV는 수십만 불과<br>지상파 강세 日서도 5년간 가입자 30만명 그쳐<br>전송속도등 기술적 완성도 미흡 "아직 갈길 멀어"
지난 9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의 가전 판매장 ‘베스트바이’. 워싱턴D.C.와 바로 붙어있는 위성도시 특성상 정부 공무원이나 IT기업 종사자 등 소득수준이 높고 첨단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이다. 매장 입구엔 삼성, LG, 소니 등이 생산한 2,000~3,000 달러의 고가 LCD, PDP TV들이 전시돼 있었다. 2009년 2월이면 전면 디지털방송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고 매장 관계자는 전했다.
디지털TV 매장 한 가운데에선 이 지역 최대 케이블방송사(SO)이자 전미 3위 SO인 COX가 디지털케이블 판촉을 펼치고 있었다. 디지털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를 묶은 번들 상품은 종류에 따라 월 85~175 달러 수준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선 최근 버라이존의 파이오스(FiOS) TV 서비스가 시작됐다. 매장 직원에게 파이오스TV에 대해 묻자 “(이름을)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파이오스TV에 대해 한참 설명을 하자 “그런 서비스는 케이블로도 다 가능한데 왜 굳이 그걸 가입해야 하냐”며 “이것만 가입해도 KBS, MBC 등 당신 나라(한국) 채널까지 다 볼 수 있다. 지금 신청서만 쓰면 일주일 안에 개통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IPTV, 케이블과 차별 미미’=이미 2년 전 IPTV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 그러나 워낙 땅이 넓다는 지리적 특성과 세계에서 케이블TV 보급이 가장 활발한 국가답게 실제 IPTV의 보급률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AT&T 유버스(U-verse)가 2006년 6월 서비스 개시 후 1년 3개월간 모은 가입자는 고작 10만 가구. 론칭 당시 2008년까지 570만 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는 사뭇 다른 중간결과다.
버라이즌의 파이오스TV는 약 50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해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하지만 가입자의 80%는 광랜인 FiOS 인터넷의 패키지 가입자로 파이오스TV만 단독으로 가입한 가입자는 전체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버라이즌의 마케팅이 패키지 상품 위주로 진행된 탓도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가 TV상품 자체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미국 내 케이블TV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케이블의 지위는 확고하다. 미국 최대 케이블사업자인 컴캐스트가 2007년 현재 2,423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타임워너, 콕스 등을 합치면 미 전역에 약 6,500만 가구의 가입자를 갖고 있다. 이 중 3,300만 가구는 이미 디지털케이블로 전환을 완료했다. 디지털케이블에선 DVR, VOD 등 IPTV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있다. 미국 케이블 사업자는 모두 인터넷과 전화(VoIP)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사와 차이가 없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선 IPTV의 실제보다 과대 포장돼 있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애틀라스리서치 보고서는 통신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빌려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보급률이 2012년까지 미국 전체의 4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서비스 자체의 품질은 훌륭할 지 몰라도 커버리지를 감안하면 케이블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컴캐스트의 마크 코블리츠 전략기획 전무는 “IPTV는 케이블, 위성을 뒤따르는 세 번째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IPTV의 경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통신사는 전화와 인터넷에 최근에야 TV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미 완벽한 TV 서비스에 빠른 인터넷를 갖추고 최근에 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IPTV는 너무 늦은 경쟁자”라고 일축했다.
◇‘IPTV, 아직은 2% 부족하다’=일찍이 2002년부터 IPTV를 시작한 일본에서 지난 5년간 모은 가입자는 30만명에 불과하다. 1억이 넘는 일본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사실상 보급이 안 된 거나 다름이 없는 셈이다. 일본은 지상파 방송의 힘이 워낙 커서 케이블조차 군소사업자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미국에선 케이블TV가 워낙 강력해 IPTV가 연착륙하기 힘든 것과 반대로 일본에선 유료방송 자체가 설 땅이 좁기 때문에 IPTV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일본에서 최초로 IPTV를 시작한 소프트뱅크 ‘BBTV’의 경우 인터넷 가입자는 350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5%도 IPTV 가입자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를 포함, KDDI, NTT 등 일본 내 굴지의 통신사들이 앞다투어 IPTV를 선보였지만 1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사업자는 아직 없다. 또 저작권 문제 등으로 NHK, 후지TV 등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도 못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메리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IPTV 강국이라는 홍콩의 경우도 IPTV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는 IPTV와 경쟁할 상대가 없다는 게 선전의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술적 완성도도 아직은 미약하다. 홍콩에서 만난 한 한인교포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TV의 전송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진다”며 “한국과 비교하면 인터넷 환경은 한참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의 주요 언론들과 IT 관련 보고서들은 IPTV가 과연 통신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IPTV,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이 부진에 허덕이는 방송사업에 통신사들이 거액의 투자를 쏟아부어 진출하려고 한다”며 “동영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지금으로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 채널독점등으로 소송제기 잇따라
지상파 재전송·저작권 갈등, 네덜란드·佛·日등 '골머리'
IPTV가 서비스 개시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힘을 못쓰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케이블이나 공중파 방송에 뒤지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건, 즉 지상파 재전송과 지적 재산권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와 일본.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케이블TV업계가 장악하고 있는 지상파 채널 전송권의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네덜란드 TV시장의 80% 이상을 확보한 케이블업계의 선두주자 CAI가 통신 1위이자 IPTV서비스 업체인 KPN텔레콤에 채널 전송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CAI 역시 케이블TV 시장에서 수십여 개 업체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KPN은 IPTV를 위해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 결과 KPN은 IPTV시장을 개척하고서도 시장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스킵바워 KPN 사장은 "인기 채널을 내보낼 수 없는 한계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에 대응해 KPN은 2년 전 CAI와 정부를 상대로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소송을 걸었다. 결과는 패배였다. 하지만 KPN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일본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저작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IPTV업체들이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과도 일일이 협상을 벌여야 한다. 사실상 저작권에 대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게 현지 업체들의 주장이다.
일본 최대 IPTV업체인 4
th미디어에 50%의 지분을 출자한 스미토모의 사사지마 가즈시케 미디어부장은 "저작권 이외에 배우들의 수입이 매우 제한적이고 방송사들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협상에 부정적"이라며 "단시간내에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IPTV의 등장과 함께 '독점'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TV(우리나라 KBS)는 1위 사업자인 오렌지와 채널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은 거대 방송사와 통신사간의 '독점적 결합'이라며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그네스 반슨트 드레이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 위원은 "이 같은 계약은 오렌지와 같은 거대 통신자본만이 할 수 있는 계약"이라며 "시장과 방송계,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리아드(Iliad)와 프리(Free) 등 2ㆍ3위 사업자들 역시 TFI와 프랑스텔레콤, 메트로폴 텔레비전 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일리아드와 프리는 이들 3사가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TPS라는 새로운 IPTV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만 채널을 공급하는 '부당행위'를 펼치고 있다고 제재를 요청했다.
미국도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한 저작권료 부담이 엄청나 쉽사리 서비스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크 프레퀸(Mark Frequin) 네덜란드 경제부 통신정책 담당자는 "IPTV는 TV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망 구축 문제부터 저작권ㆍ재전송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들은 당분간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송영규차장대우(팀장)·권경희·최광·황정원·임지훈기자(이상 정보산업부)·이상훈기자(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