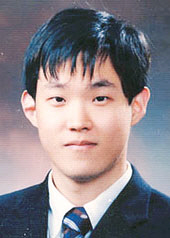|
"생존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신년사다. 단순히 한 기업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에 드리운 절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 신년사는 올해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가 엄습한 지난 1998년 1월에 내놓은 구 회장의 신년사다. 18년이 흐른 지난 4일 "성장은 고사하고 살아남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한 구 회장의 올해 신년사와 꼭 닮았다. 1998년의 화두였던 생존이 다시 등장할 만큼 최근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뜻이다. 최근 만난 재계 고위 관계자가 "10년 이상 장기 저성장이 올 수 있다더라"고 하는 것도 엄살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실제 이런 분위기는 여기저기에서 읽힌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저성장 기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판매 목표 자체를 낮췄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작은 구멍 하나에도 커다란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뿐인가. 삼성은 2014년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나섰다. 일부 기업에서는 20대 직원과 신입사원 희망퇴직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은 최근 1년 새 일자리만 5만개가 사라졌고 대형 금융그룹 계열사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들이 최고경영자(CEO)로 속속 임명되고 있다.
위기의 전조인 셈이다.
심각한 위기론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미래의 위험을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는 기업인들의 본능적인 위험감각을 더 키웠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국의 침체와 국제 정세 불안, 미국 금리 인상은 위기감을 한층 키워주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의 재계는 경각심을 넘어 공포가 지배하는 것 같다.
한 경제단체의 임원은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일류 기업이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있으려니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주요 기업에서 시작된 선제적 움직임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산업계 전체로 퍼지는 것이다. 비약하면 '공포 바이러스'가 업계 전반에 엄습하는 듯한 양상이다.
경제는 심리다. 적정 수준의 위기론은 좋지만 위기론이 과도해지면 산업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절약의 역설'이 있듯 기업이 지나치게 비용을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내수는 침체되고 결국 기업에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국가 경제, 사회적인 책임을 골고루 따져봐야 한다.
'위기'를 강조하되 방점은 '위기 돌파'에 둬야 한다. CEO의 위기 돌파 메시지가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합심의 계기가 돼야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빌미가 돼서는 곤란하다.
전직 경제 고위 관료는 "왜 만날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게 잡느냐"는 기자의 힐난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침잠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지의 표시"라며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2016년, 새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계의 도전 정신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한 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 매년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경영은 힘들어졌으며 개개인의 삶은 척박했다.
하지만 그렇게 위기의식만 갖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봐, 해봤어?"라는 아산 정주영 회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DNA가 내재 돼 있다고 믿는다.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 번 자신감을 갖고 뛰어봤으면 한다. 각종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고 직원과 고객을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런 기사를 써보고 싶다. '경기불황, 기업 도약의 기회'.
/산업부=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