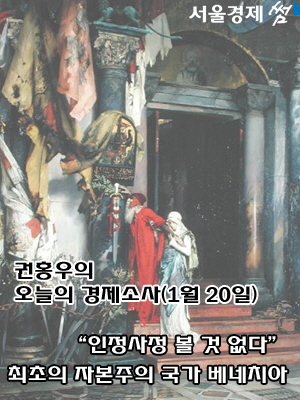영웅의 재판을 앞두고 베네치아가 술렁거렸다. 최고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17인 위원회는 골머리를 싸맸다. 피고가 카를로 첸(Carlo Zeno, 1333?~1418)이었기 때문이다. 첸이 누구인가. 숙적 제노아와의 싸움에서 멸망 직전까지 몰렸던 베네치아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영웅 아니던가.
뇌물죄로 체포되던 순간부터 베네치아의 여론이 들끓었다. ‘영웅을 누가 감히 단죄할 수 있냐’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럴 만했다.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지만 지중해의 무역권을 두고 130년 동안 4차례나 전쟁을 벌였을 만큼 앙숙인 제노아의 마지막 공격을 물리친 국가의 수호자가 바로 첸이었으니까.
시민들도 그를 좋아하고 아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성직자의 길이 보장돼 있었으나 모험을 좋아해 외국서 용병 생활을 하고 여성 편력까지 심했던 그를 베네치아인들은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툭하면 배를 타고 나가 잊을 만 하면 막대한 전리품과 함께 돌아오곤 했던 그는 제 4차 베네치아-제노아 전쟁(1377~1381)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제노아와 그 동맹군에 완전 포위돼 6개월 동안 간신히 연명하던 상황. 11척의 갤리선으로 베네치아를 오래 전에 떠나 제노아의 항구들을 공격하던 첸은 노획한 전투함 7척에 용병까지 데리고 돌아와 전장의 흐름을 뒤바꿨다. 그런 첸이 뇌물죄로 기소되다니!
국가도 그의 공로를 잘 알고 있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베네치아가 파도바를 점령(1405)하면서 확보한 서류 뭉치 속에서 해군 사령관 시절의 첸에게 금화 400두카트가 전달됐다는 서류가 들어있었기에 기소가 불가피했다. 법정에 선 첸은 파도바의 영주가 어려울 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증인과 증거가 없었다.
귀족의 오직(汚職) 행위에 대해 추상(秋霜) 같이 처리해오던 베네치아였으나 처음에는 용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오랜 외교관 생활로 외국에도 친구가 많은 첸을 단죄한다면 국익이 저해된다는 서한도 빗발쳤다. 결정권을 쥔 17인 위원회의 구성원 대부분도 첸의 부하 출신이었다.
격론의 한 가운데에서 1406년 1월 20일, 베네치아 17인 위원회는 첸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 징역 2년형과 공직 영구 박탈. 통령(국가 원수) 자리를 눈앞에 뒀던 73세의 첸은 지하감옥에서 형기를 마쳤다. 출옥한 첸은 인기가 더욱 높아져 국내외 방문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으나 다시금 정치에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성지 순례와 독서로 여생을 보냈다.
베네치아는 왜 국민적 사랑을 받는 거물 정치인을 ‘고작 저택 한 채 가격인 400두카트’ 때문에 처벌했을까. 400두카트는 첸의 공로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첸이 베네치아를 구원하기 직전 나포했던 제노바 상선 ‘리키뇨니’호 한 척에 실린 적하물의 가치만 50만 두카트. 첸의 부하이며 전우였던 17인 위원회의 위원들은 왜 유죄를 내렸을까.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의 ‘침묵하는 소수(Silent Minority)’에 나오는 17인 위원회의 토론 장면. ‘카를로 첸이 영웅이고 인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재를 처벌하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한다면 정말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나라에서는 언제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상인들의 공화국인 베네치아가 풍요를 누리며 1,071년 넘게 존속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배계급일수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잣대. 하바드대, 컬럼비아대 교수를 지낸 중국인 사학자 황런위(黃仁宇, Ray Huang) 교수는 명저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청교도에서 나왔다는 막스 베버의 주장과 유대교에서 기원한다는 베르너 좀바르트의 주장은 베네치아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상업공화국인 베네치아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뿌리 내렸고 그 기저에는 지배층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다.
베네치아가 인기 절정의 국가 원수급 원로를 주택 한 채 뇌물 의혹 때문에 사법 처리한 날로부터 610년이 흐른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국을 생각한다. 법과 행정, 정치는 공정하고 깨끗하며 올바른가. 탈세에 편법 투기, 병역 기피 의혹이 가득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마저 필요 없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또 먹혀들어가는 세상…. 토론도 대화도 생략된 채 망각증후군의 맹목적 습성만 강요받는 현실이다.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지속적일까./권홍우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