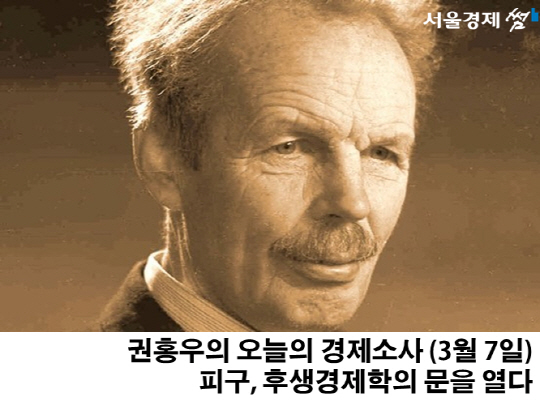20세기 초반,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은 경제학자는 누구일까.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라고 답한다면 사실과 다르다. 케인즈는 대공황이 본격화한 1930년대 이후에 빛을 봤다. 주인공은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케인즈보다 6살 위인 피구는 초년 경제학자 시절, 나이 차이 이상으로 케인즈를 앞섰다.
피구는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27세에 이미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1887년 ‘영국의 제주도’격인 와이트섬에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난 피구는 다른 꿈이 있었다. 명문 사립인 해로우를 장학금으로 다니고 케임브리지에 입학해 역사를 전공하며 시를 지었다. 저명한 대회에서 수차례 문학상을 받은 적도 있는 그는 점차 경제학으로 빠져들었다. 걸출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피구를 ‘광명(시)’보다 ‘세상을 구할 과실(경제학)’로 이끈 인물은 알프레드 마샬. 고전학파 경제학의 완성자라는 마샬의 눈에 뜨인 그는 불과 31세 때는 스승의 후계자로 뽑혔다.*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정치학을 떼어내고 경제학만 남긴 케임브리지대의 경제학과 초대 정교수가 마샬, 2대 정교수가 피구다. 피구가 케임브리지에 안착할 무렵 케인즈는 동인도회사의 사무관 정도였으니 둘의 차이는 컸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강조했던 스승인 마셜처럼 피구는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침 영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국내에서는 부의 편중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을 때 피구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다시금 행복한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놓고 머리를 싸맸다.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1920).’ **
후생경제학의 특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경제학 태동의 토양을 제공했던 제레미 밴덤의 공리주의 철학과 애덤 스미스 이후 영국 경제학을 결합했다는 점. 피구는 후생경제학의 3대 명제인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방임경제와 구분되는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대공황기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가려 크게 각광 받지 못했어도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에 아직도 남아 있다.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케인스와 벌인 논쟁도 유명하다. ‘한계효용을 살짝 후생으로 이름만 바꾼 데 불과하다’는 논쟁에도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끝없는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다 .
1959년 3월 7일, 82세로 세상을 떠난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외형적으로는 영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파묻혀버리고 말았다. 저물가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성장에 기여한다는 ‘피구 효과’도 전세계가 ‘D의 공포(deflation·지속적인 물가 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갈수록 새롭게 부각되는 피구의 유산도 적지 않다.
평생을 강단과 서재에서만 묻혀 살던 피구가 소련 출신의 발레리나와 결혼하는 등 케인즈처럼 대중적 화제를 뿌리고 다녔다면 혹여 유명세를 더하고 오늘날의 경제학에도 더한 영향을 미쳤을까. 알 수 없다. 분명한 점은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피구의 후생경제학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다. 기후문제 해결책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도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피구세(Pigouvian Tax)’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효용이 낮은 부분의 상대적 잉여를 고효용 부분으로 옮기자는 제언 역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권홍우논설위원 선임기자 hongw@sed.co.kr
*1908년 피구가 31세 나이로 케임브리지대 정교수 자리를 꿰찬 데에는 스승인 마샬의 강력한 천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여기에 다른 속사정이 있었다고. 원래 마샬이 맡고 있는 경제학과 정교수의 후계자 자리는 폭스웰이라는 학자가 유력했다. 마침 영국은 조지프 체임벌린 식민성 장관이 1903년 관세개혁(조건부 보호무역론)을 주창한 이래 논쟁에 빠져 있던 상황. 보호무역론의 이론적 지주격이던 마샬은 보호무역파에 동정적인 폭스웰이 마뜩지 않았고 결국 자유무역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던 피구가 선택받았다.
**역저 ‘후생경제학’은 영국이 무역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정도로 위기라는 현실 인식에 대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피구의 스승인 마샬의 경제학은 ‘생산성 향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피구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영국 경제의 성장은 더 이상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온갖 문제점이 튀어나왔다. 노사 관계와 환경 문제, 시장경제가 초래한 분배의 불평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피구는 ‘후생경제학’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