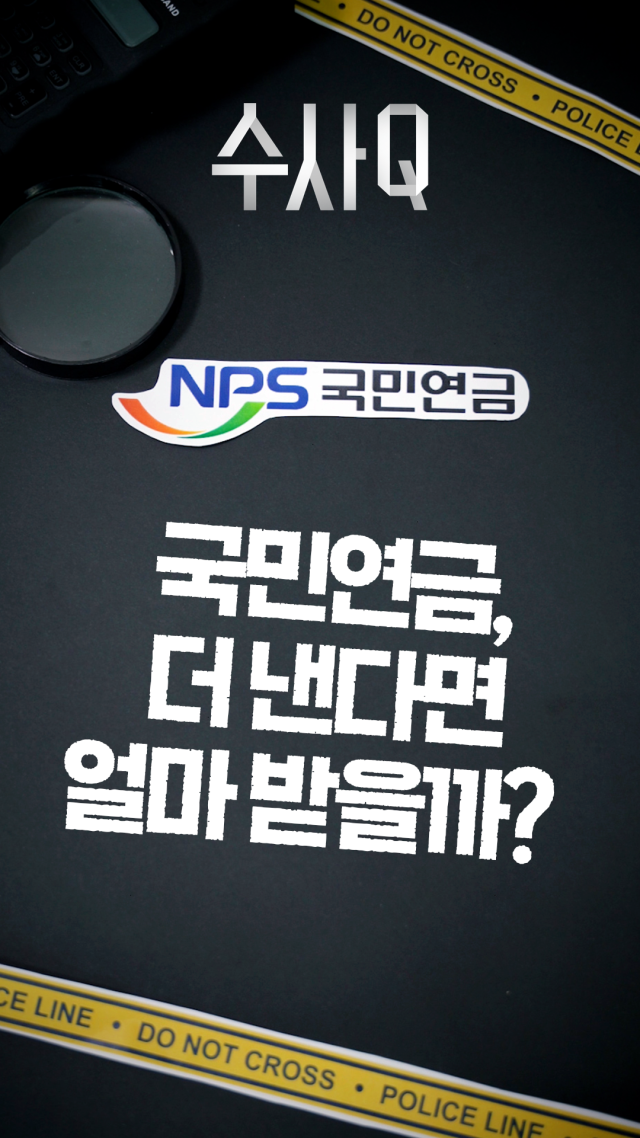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해 있는 전기차 기업 파워프라자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의 화물전기차(0.5톤)인 라보 피스를 제주도에 보급했다. 한국지엠의 라보 트럭을 순수전기차(EV)로 개조한 피스는 1회 충전에 최대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파워프라자는 올 3월까지 제주도와 서울에 피스를 총 7대 판매했으며 올해 최고 100대까지 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워프라자는 이제 수 년간의 전기차 개조 경험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2인승 소형 EV ‘예쁘자나R2’도 이르면 내년 생산할 계획이다. 배터리 타입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765km에 이르는 예쁘자나R2는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도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김성호 파워프라자 대표는 “붕어빵 찍듯 차체를 통째로 주조할 수 있는 공정기술로 판매가를 4,000만원대까지 낮췄다”며 “모터와 배터리팩 등이 중심인 EV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구조가 단순해 우리 같은 중소업체가 도전하기 좋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테슬라 꿈꾸는 중소 전기차 벤처들= 1925년 창업한 크라이슬러 이후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등극한 첫 미국 기업으로 평가받는 테슬라모터스. 최근 테슬라는 EV 신차 ‘모델 3’로 전세계에서 1주일만에 32만5,000대 예약주문을 받아냈다. 차량을 실제로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약 140억달러(약 16조2,120억원)의 매출로 환산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서도 파워프라자 같은 토종 전기차 기업들이 속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차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면서 한국판 테슬라 신화를 꿈꾸는 벤처 기업가들이 무대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는 완성차 시장의 진입장벽이었던 막대한 자본과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역량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 구도를 흔들기 좋은 개척지이기도 하다.
국내 중소 전기차 업체 가운데 주목받는 곳 중 하나는 코스닥 상장사인 쎄미시스코다. 쎄미시스코는 아예 전기차 플랫폼을 통째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계열사인 새안모터스가 완성차를 만들고 쎄미시스코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새안은 2인승 소형 EV ‘위드’를 올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며 전기 스포츠카인 ‘ED-1’도 개발하고 있다. 성서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을 잡은 다윗을 본따 ‘다윗 전기차(Electric David)’란 의미를 지닌 ED-1은 최대 2억원대 가격에 제로백 2.8초, 최고 302km/h의 성능을 갖췄다고 이정용 새안 대표는 설명했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300km 수준이다.
◇대세로 떠오른 전기차…토종벤처 재도약 성공할 수 있을까= 국내 벤처기업들의 전기차 사업 진출 역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거의 없어 2010년대 초 대부분 사라졌다. 대표적 메이커로 통하던 CT&T와 AD모터스는 사업을 접었고 레오모터스는 골프장 전동카 기업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비슷한 시기 피스커·코다·씽크 같은 전세계 전기차 업체들이 매각이나 부도 수순을 밟았다.
전기차 벤처들은 정부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2030년 전기차 100만대(순수 EV 기준) 시대를 공언하고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보조금을 약속하면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본다. 국내 전기차 산업의 시험대인 제주도의 경우 2030년까지 역내 37만7,000여대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공개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아이오닉·쏘울EV 같은 전기차 개발·출시에 팔을 걷어부치고 테슬라는 물론 유럽·일본·중국서 전기차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분위기를 고무시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지난해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로 친환경차의 표준은 결국 EV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골리앗 이기는 다윗?…규제·인프라 등 과제도 산적= 다만 국내 토종 전기차 벤처들이 성장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아직 규제·인프라 정비 등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인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파워프라자나 쎄미시스코 모두 자체 개발한 전기차를 국내서 팔 수 없어 해외 시장에 먼저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 등에는 이미 마련돼 있는 1,000대 미만 생산 차량에 대한 별도 판매허가 제도가 아직 없어서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4분기 기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가 총 4,945대이며 급속 충전기는 337기, 완속 충전기는 4,865기가 설치됐다고 집계했다. 급속충전기만 5,400기 넘게 설치된 일본과 비교하면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과 제주도를 벗어나면 전기차 운전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다. 그나마 충전기 규격도 통일돼 있지 않아 여러 규격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소량 생산 차량 별도 인증제 같은 관련 법규를 연내 도입하고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약 3,3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주류 완성차 업체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기차 투자를 강화하고 신차를 쏟아내면서 중소 벤처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대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신속히 새 시장을 장악하는 스타트업 성공 방정식이 전기차 분야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기차 벤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제너럴모터스(GM)나 닛산처럼 오래 전부터 전기차에 투자하며 지금 결실을 보는 대기업도 있지만 아직 상당수 주류 완성차들은 전기차 개발에 미적거리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공정에서 판매까지 체질을 전면적으로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만큼 제 2의 테슬라가 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