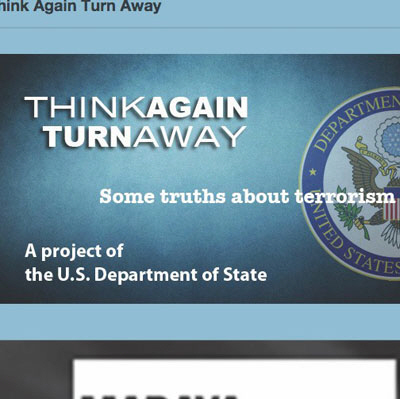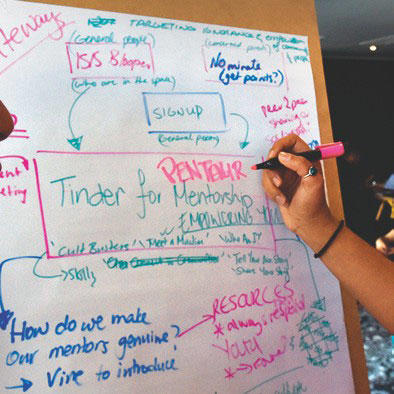IS의 위협이 커지면서 새로운 동맹들이 소셜 미디어라는 전장에서 IS에 반격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테러리스트의 선전선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반박하는 공식기관을 만들었고, 기업들은 IS가 자사의 서비스 및 제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개인 행동주의자들이 IS의 모병 담당자를 찾아내 젊은이들이 그들의 꾐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 또한 IS의 계정을 찾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비조직적 동맹 관계지만 IS를 소셜 미디어 생태계에서 축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 진압 작전
콘텐츠 선별
자유롭고 제한받지 않는 메시지의 전달을 위한 플랫폼인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조차 지하드 무장단체 대원들의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유튜브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IS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있다.
트위터 계정 사냥
어나니머스를 비롯한 해커 그룹들이 IS의 트위터 계정을 적발해 공개하고 있다. 지금껏 10만개 이상의 계정을 발견, 삭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커들은 IS 계정을 찾아 수백차례나 연속해서 ‘신고하기’가 클릭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수색 정찰
계정은 삭제해도 신속히 재생성될 수 있다. 때문에 해커들은 IS의 계정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계정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에 맞서 IS도 이런 특징들을 자동적으로 숨겨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 해킹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해커들은 수만 대의 컴퓨터를 링크시켜 봇넷(botnets)으로 만듦으로서 IS 웹사이트에 압도적인 DDoS 공격을 가한다. IS의 서버에 실제로 불을 지른 적도 있다.
사보타주
해커들은 대다수 일반 검색엔진이 찾지 못하는 딥웹 속에서 IS의 인터넷 모병소와 비트코인 기부 페이지를 찾아내 파괴한다. 일례로 고스트 시큐리티 그룹은 IS의 소셜 미디어 선전용 허브 사이트를 비아그라와 프로작 홍보 사이트로 바꿔놓았다.
신상털기
해커들이 IS 지원자를 가장해 모병관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그들의 정체와 위치를 파악해 현지 관계당국과 전 세계에 공개한다. 한 해커팀의 성공적 정체 규명으로 작년 7월 튀니지에서 벌어질 뻔했던 테러 공격을 저지하기도 했다.
■ 모병 차단
반론과 반박
미국 정부는 다수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텀블러 계정을 운용하면서 IS의 선전선동 내용과 거짓 정보에 대한 반박정보를 포스팅하고 있다. ‘다시 생각하고 돌아서라(Think Again Turn Away)’ 캠페인도 그 일환이다.
표적 광고
영국의 싱크탱크인 전략대화연구소(ISD)는 구글에 입력되는 검색어로 잠재적 IS 지원자들을 식별한다. 예컨대 ‘시리아로 가는 방법’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IS 선전 영상과 도입부가 비슷하지만 반극단주의 관련 내용이 담긴 영상들이 검색결과로 나타난다.
대(對) IS 해커톤 대회
호주에서 개최된 해커톤 대회에서 웹 개발자들과 무슬림 지도층들에 의해 IS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온라인 툴이 개발됐다. 그중에는 무슬림 청소년들의 소셜 네트워킹에 특화된 협동 게임과 데이팅 앱 ‘틴더’에서 착안한 ‘멘토링 틴더’ 앱도 있었다.
■ 방첩 활동
IS 포럼 잠입
각국 정보기관과 해커들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해 IS의 온라인 포럼에 침투하고 있다. 그곳에서 이른바 ‘벽에 붙은 파리’가 되어 IS 모병관과 모병 대상에 관한 정보를 빼낸다.
공개된 정보 분석
연구자들이 IS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면밀히 분석,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 규명한다. 또한 포스팅된 내용을 통해 그들의 유형과 습성을 파악한다. 그렇게 IS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심사를 찾아내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
피해자의 직접 증언
IS 지배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IS의 잔혹한 범죄를 고발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선전 내용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적발되면 즉결 처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숨을 건 용감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선전선동의 역사
선전선동 기술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수백 년간 변함이 없다. 적의 생각을 읽고, 포섭 가능성 있는 적의 마음을 움직여 아군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1800년대 전단 살포
미국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헤이마켓 사건(Haymarket affair)의 발단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선동적 내용을 담은 전단이었다. 1902년에는 러시아 사회혁명당이 차르 정권 타도를 위해 전제정치에 대항해 테러 활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전단을 발행했다. 이는 테러리스트라는 용어가 현대적으로 쓰인 첫 사례이기도 하다.
1940년대 무선 방송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게릴라 저항운동 조직들이 지하 무선방송을 활용했다. 나치의 지배 하에 있었던 유럽에서 특히 그랬다.
1970년대 카세트테이프
추방당한 종교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의 연설을 담은 카세트테이프가 이란의 반정부 학생들 사이에 확산됐다. 이것이 1979년 이란혁명을 이끈 기폭제 중 하나가 됐다. 당시 이란의 한 관료는 전투기보다 카세트테이프가 더 무서웠다는 말을 남겼다.
1980년대 VHS 비디오테이프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소련군에 맞서던 무자헤딘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희미한 비디오테이프들이 전 세계 이슬람 사회로 퍼져갔다. 무자헤딘이 보스니아 내전과 체첸전쟁에 참여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비디오가 유포됐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 등 당시 떠오르던 테러집단의 수장들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추종자들에게 보급했고, 추종자들은 이를 대량 복사해 살포했다.
1990년대 웹사이트
1991년 최초의 지하드 웹사이트 ‘이슬람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후 유사한 사이트들의 개설이 잇따랐다. 이런 웹사이트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생각이 담긴 글을 접할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동영상
2001년 중반 알카에다가 첫 온라인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통해 2000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콜(Cole)호에 자살 폭탄테러를 가해 17명을 숨지게 한 장본인이 자신들이라 주장했다. 그렇게 테러리즘과 기술이 맞물리며 테러의 인터넷 시대가 본격 열렸다.
딥웹 (Deep web) - 비밀번호와 지불 장벽, 특수 보안소프트웨어 등에 의해 보호되면서 허가된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들을 뜻한다.
ISD - 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BY EMERSON BROOKING AND P.W. S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