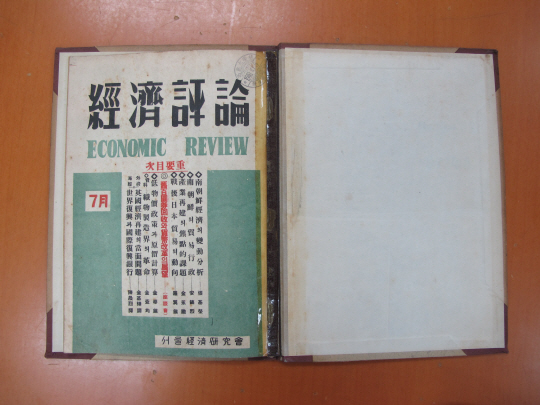한국일보가 눈부시게 성장하자 당대 최고의 기업인이 백상에게 경제신문사를 같이 만들자고 제의해왔다. 백상은 이를 정중하게 고사했다. 한국일보를 창간한 지 2년밖에 안 지난데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해방 직후인 1947년 백상의 주도로 설립한 서울경제연구회 멤버들이 경제지 창간을 모색했음에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1960년에야 서울경제신문을 창간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백상의 추진력 이면에는 남다른 신중함이 있었다. 돌다리도 수없이 확인한 후에야 건너는 면모는 ‘일간스포츠’ 창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경제 창간 직전 한국올림픽위원회(KOC) 상임위원을 맡았던 백상에게는 스포츠신문 창간 제의도 숱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백상은 끝내 기다렸다. 서울경제신문의 4면을 전면 스포츠면으로 활용하는 기간만 8년을 거쳤다. 백상이 스포츠신문 창간을 기다린 것은 무엇보다 서울경제가 잘나갔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서울경제신문은 1개면 전면을 스포츠에 할애한 유일한 일간신문이었다. 종합지들도 스포츠면을 따로 제작하지 않던 1960년대에 백상은 가뜩이나 좁은 지면이 더 좁아져 경제 기사를 올리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우려에도 서울경제에 스포츠 1개면을 고정시켰고 이는 보기 좋게 들어맞았다. 스포츠 기사를 원하는 일반 독자들은 서울경제를 앞다퉈 찾았다.
서울경제를 통해 스포츠 신문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스포츠전문지가 1963년 첫선을 보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일간스포츠’였다. 그러나 이때 나온 일간스포츠는 서울경제를 모태로 창간된 일간스포츠와는 전혀 다른 신문이었다. 주간지인 ‘일요신문(요즘의 일요신문과는 별개의 매체)’이 갈아입은 옷의 제호가 바로 ‘일간스포츠’였다. 일요신문이 변한 일간스포츠는 매일 4면을 발행하면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전면적인 스포츠신문 발행 1년2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성과에 그쳤던 일간스포츠는 1964년 10월 경제지로 발행 형태를 바꿨다. 제호를 일간경제신문으로 변경하고 편집도 서울경제신문과 똑같이 4개 면에 1개 면을 스포츠에 할애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일간경제신문의 경영 성과도 신통치 않았는지 1년 뒤인 1965년에는 제호가 현대경제일보로 다시 바뀌었다.
사라졌던 ‘일간스포츠’라는 제호는 1969년 백상 장기영이 새로 창간하는 스포츠신문의 제호로 채택하면서 화려하게 재탄생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모태였던 일간스포츠는 신문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한 일간지로 자리 잡으며 스포츠 대중화를 선도하는 매체로 떠올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한국 대표를 맡을 만큼 체육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일간스포츠를 창간할 때까지 서울경제를 통해 장기간의 사전 준비를 거쳤던 백상 장기영의 신중함과 치밀함, 판단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남은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다. 스포츠신문으로 자리 잡지 못한 옛 일간스포츠는 일간경제신문과 현대경제일보를 거쳐 신군부가 탄생한 1980년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으로 뛰어올랐다. 강제폐간당한 서울경제신문의 빈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은행연합회와 전경련의 출자를 받아 자본 충실화를 기하고 이름도 한국경제신문으로 바꿨다. 복잡하게 얽힌 서울경제와 일간스포츠,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제호에는 백상과 서울경제신문의 옛 영광과 애환의 흔적이 담겨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