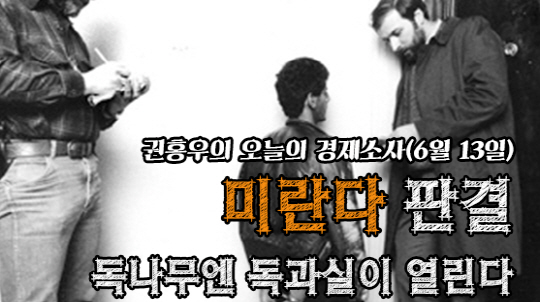미란다(Miranda). 라틴어 미란두스(mirandus)에서 나온 여성형 이름이다. 영어에서는 세익스피어의 ‘템피스트’(1611)‘에 미란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호주 출신의 모델 ‘미란다 커’나 포르투갈의 전설적 여가수 카르멘 미란다 등의 이름도 친숙하다. 1995년 공연예술물로는 사상 처음으로 음란하다는 이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연극도 ‘미란다’였다.
여성형 인명 고유명사인 미란다를 이름으로 쓰는 남성들도 종종 있다. 르네상스 시대 포르투갈 태생의 시인이자 선각자인 프란시스코 미란다는 분명 남성이다. 또 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미란다 원칙을 이끌어낸 당사자인 바로 그 사람이다. TV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권리를 알려주는 통지 행위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면 공익 변호사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판결은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판결의 하나로 손꼽히는 판결이다. 정작 그 판결의 당사자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피의자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과는 거리가 먼 성폭행범이었다. 멕시코계 미국인인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비뚤어지기 시작해, 10대부터 강도 및 성폭행 혐의로 감옥을 세 번이나 들락거렸던 범죄자였다.
미란다가 세기의 재판을 받게 된 계기는 1963년 3월의 은행 강도. 바로 체포된 22세의 미란다는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 두 시간 여의 경찰 심문에서 다른 죄를 털어놓았다. 십 여일 전에 18세 소녀를 납치해 이틀간 감금하며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피해자도 다수의 용의자 대조 심문에서 미란다를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애리조나 법원이 소녀 납치와 성폭행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각각 20년과 30년. 미란다는 과연 진범이었을까. 그렇다는 게 정설이다. 더욱이 미란다는 ‘경찰의 강압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조사에 임했다’라는 내용의 자술 진술서에 서명 날인도 남겼다. 지방법원과 애리조나 법원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미란다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란다 재판은 애리조나주 법원 판결 당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쟁점은 경찰의 피의자의 권리 사전 고지 여부. 결국 연방대법원은 1966년6월13일 최종 공판에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원심 환송!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으며 진술거부권도 보장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대법관 9명이 5 대 4의 근소한 차이로 확정된 미란다 판결은 미국 사회에 거대한 논란과 반발을 낳았다. 검사와 경찰들은 수사가 힘들어지고 흉악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거품을 물었다. 변호인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조언을 들은 피의자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미란다 같은 쓰레기를 위해 미국의 고귀한 가치가 희생됐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수사기관들의 지적대로 미란다에게는 문제가 많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애리조나 검찰은 다른 증거들을 보태 미란다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 미란다는 유죄 판결을 받아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1972년 가석방된 미란다는 1976년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려 칼을 맞아 죽었다. 미란다 살해용의자를 체포했던 경찰은 13년 전 미란다를 체포했으나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경찰. 미란다 살해 용의자가 미란다 원칙을 내세우며 묵비권을 행사해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은 아이러니다.
미란다 살해 직후 피의자의 권리 보장이 범죄를 조장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었으나 과연 그랬을까. 결코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파괴되지 않았다. 미국의 검경은 끊임없이 미란다 원칙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면서도 수사기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새로운 수사 관행도 미국의 전통으로 굳어졌다.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이 이때부터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한국에서는 1996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수사당국이 마음만 먹고 정보를 흘려 여론까지 움직이면 누구든 ‘포괄적’으로 죄인을 만들 수 있는 풍토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미란다 원칙의 핵심 논리는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면 결과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독수 독과(毒樹毒果)론’이 자리 잡고 있다. 독나무의 과실에는 독이 들어 있으니 증거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기 전에 독나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