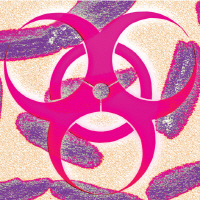탄저균은 20세기 초 이후 생물학무기의 대명사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연합군의 가축 몰살을 목적으로 무기화를 처음 연구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각국이 탄저균 무기 개발을 경쟁했다. 영국은 그뤼나드 섬에서 탄저균 폭탄을 실험했고 만주의 일본 731부대도 인간 생체를 대상으로 실험한 사례가 있다. 냉전 시대인 1978년에는 구소련에서 배양균이 유출돼 가축과 70여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제조·운반이 간단하고 살상 효과가 치명적이어서 ‘빈자(貧者)의 핵무기’라고도 불린다. 원래 가축 전염병인 탄저균은 흙 속에 포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하기 쉽고 소독제나 환경변화에의 내성이 강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곧잘 테러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이유다. 일본 옴진리교는 실제 탄저균 살포를 계획했었고 9·11 이후 알카에다는 탄저균이 든 백색가루를 서방국가에 무차별 배달하는 ‘우편테러’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기도 했다.
이처럼 악명이 높지만 탄저균은 사실 현대 세균학의 정립에 공헌한 주체다. 1876년 로베르트 코흐가 병의 원인이 세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한 것이 탄저균이다. 루이 파스퇴르는 1881년 양을 대상으로 탄저균 예방접종을 실험했다. 탄저균은 이처럼 인류에게 발견된 후 무기화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동시에 진행된 특이한 생물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에 감염된 예가 많지 않다고 한다.
북극권에 속하는 시베리아에서 75년 만에 자연상태의 탄저병이 발생했다고 한다. 영구동토층에 묻혀 있던 동물 사체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해동되면서 밖으로 나온 탄저균에 순록과 유목민에 순차 감염됐다는 것이다. 소년 1명이 사망하면서 비상이 걸린 러시아 정부는 훈련을 받은 군 요원을 급파하고 유목민들을 몽땅 이주시켰다고 한다. 한낱 미물인 박테리아를 사악한 목적으로 악용한 인간들에 대한 ‘탄저균의 경고’처럼 들린다. /온종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