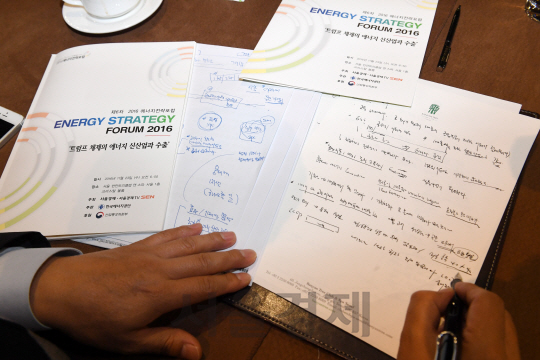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의 장은 뜨거웠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진국에서 먼저 실적을 쌓아야 신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또 개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공공, 그리고 금융·컨설팅을 아우르는 ‘얼라이언스(동맹)’ 방식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대안제시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6차 에너지전략 포럼 자유토론에서 심섭 GDC 회장은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처음 접근할 때는 ‘실적(track record)’를 쌓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개도국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금융조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개도국 정부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수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선진시장에서 실력을 다진 뒤에라야 개도국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성훈 LG화학 전무는 “부품공급업자로서는 에너지 신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토털 솔루션 공급자가 돼야 한다”며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은 유럽·일본 중심으로 선진국 시장이 먼저 형성돼 있는데 이곳에서 실적을 쌓고 개도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태석 LG CNS 상무도 “제품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정보기술(IT)과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다른 나라와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종합(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영섭 한국전력 해외신에너지사업처 부장은 “전력 피크(peak) 때 가격이 크게 뛰는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피크 절감형 마이크로 그리드를, 전력망을 까는 게 경제적이지 않은 남미 등에서는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사업경험을 공유하는 정보공유 체제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홍인관 코캄 총괄이사는 “기업들이 영업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는다지만 모여서 조금 더 상세하게 현실적인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정보공유 체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가 선두에 서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장중덕 우진산전 상무는 “남태평양 한 곳에서 에너지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공단의 보증을 받고 나서야 타당성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에너지공단과 컨설팅 회사, 그리고 부품 제조기업이 얼라이언스를 맺어 사업 개발 단계부터 수주·준공까지 같이하면 중소기업에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문성욱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상무는 “KT도 해외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데 허들(장벽)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나 에너지 공기업 등이 주도하고 여기에 중소기업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하는 데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성공 사례들을 모으고 공유도 하는 신산업 수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