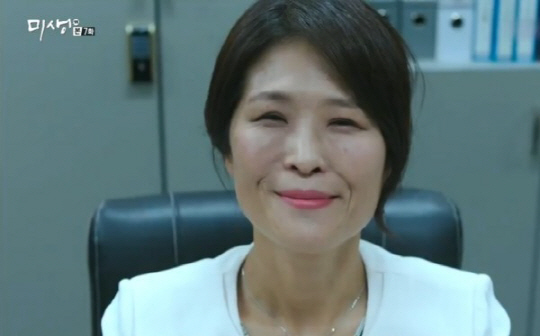# “야, 김ㅇㅇ”
짜증과 날카로움, 한숨이 뒤섞인 말투로 제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뭘 얼마나 잘못한 걸까요?
부름을 받자마자 “네”라고 외치며 죄지은 사람 마냥 달려갑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불리는 이름이지만 체감 온도는 매번 다릅니다.
ㅇㅇ아, ㅇㅇ, 김ㅇㅇ, 야!, 김ㅇㅇ씨, ㅇㅇ씨…
누가 어떤 기분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야!’로 시작하거나 성을 붙여 이름이 불릴 때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만 같습니다.
달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어제 제출한 보고서가 잘못된 걸까’, ‘내가 빼놓고 처리 못한 일이 있던가’ 등등 이미 마음에 돌덩이를 얹은 채 이름을 부른 상사 앞에 자리합니다.
그렇게 지시사항을 하달 받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의 끈이 일순 느슨해지면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직급을 붙여 이름이 불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큰 뜻을 담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내일은 조금 덜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곱씹을수록 슬픈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평적인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호칭 파괴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장, 과장, 차장, 대리처럼 직급을 나타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 담당, ㅇㅇ님 등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것이죠. 제임스, 매기, 애슐리 등 영어이름을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목표는 같습니다.
수직적이고 딱딱한 문화를 지양, 유연하고 소통이 원활한 문화를 지향하기 위함이죠.
기업들이 이토록 수평적 문화 정착을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로운 소통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소통이 가능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좋은 기업에 좋은 인재가 모이는 일종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3월 대한상의와 맥킨지가 공동 발표한 ‘한국 기업의 조직 건강도와 기업문화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조직 건강을 해치는 핵심 요인 중 첫 번째가 일방적·권위적 리더십 스타일과 리더십 역량 부족으로 꼽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유능한 인재들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모호한 요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텨야만 할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ㅇㅇ씨’…이름 부르기를 시작한다고 마법처럼 기업문화가 바뀔까요?
호칭 자체보다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험악한 분위기에서 ㅇㅇ씨 불러봤자 ‘자유롭다’ 느낄 리 만무합니다.
결국 호칭 파괴, 혹은 변경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호칭 변경의 목적은 결국 구성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직무에 대해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사명감을 높이거나 친근함을 통해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의 트럭 운송 회사인 PIE는 전문성 부여에 성공한 경우로 평가받습니다. PIE는 운송 계약 과정에서 컨테이너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25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PIE가 도입한 해결책은 ‘전문가’ 호칭 제도였습니다. 물품 배송 전문가, 물품 분류 전문가 등 전문가 호칭 제도 도입 한 달 만에 배송 실수는 56%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내 일’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내달부터 호칭 파괴 대열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재계의 ‘맏형’이 나선다고 하니 엄격한 상하관계로 유명한 (소위 군대식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평가받는) 대기업에 새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분명한 건 호칭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점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