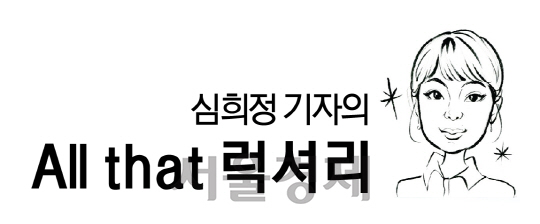3년 전인 2014년 여름 만 하더라도 친구가 이태리 출장지에서 아웃렛에 들렸다며 구찌 가방이 저렴해 사다 준다고 했을 때만 해도 나는 “요즘 누가 구찌 가방을 드냐”고 콧방귀를 꼈다.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사는 이유는 사실 과시 욕구가 더 크다. 무인도에서 누가 명품을 들겠나. 한 마디로 구찌는 명품이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명품이었다. 저 gg로고는 루이비통 LV와 짝퉁 1위를 다투지 않는가 하며.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던 구찌가 2015년부터 확 달라졌다. 레드,그린 같은 원색 컬러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려한 패턴, 위트있는 디자인을 넘나들며 명품업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구찌의 파격에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디렉터(이하CD)로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전격 등판이 자리했다. 10년 간 구찌 잡화 부문에서 내공을 쌓아온 무명 디자이너 미켈레는 구찌 아이덴티티를 간직한 원색 컬러를 활용해 아이코닉한 로고를 위트있게 재해석하고 여기에 현대적 트렌드를 가미해 공전의 히트를 쳤다. 전세계 패피들은 새로운 구찌에 열광했고 그의 신제품을 갖기 위해 오늘도 줄을 선다.
미켈레는 ‘뮬 슬리퍼’에 누구도 예상못한 퍼(fur)를 달았고, 청바지 바디(body) 전체에 강렬한 붉은 뱀 자수를 놓았으며 스터드와 진주를 슈즈 굽에 다는 파격을 가했다. 귀족스러움을 추구하는 명품과는 어울릴 법하지 않은 하트도 곳곳에 배치해 사랑스러운 구찌를 탄생시켰다. 구찌는 2000년대 풍미했던 ‘톰포드 시대’를 능가하는 최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구찌 매출은 2013년 4조 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하락, 2014년에도 다시 3.5% 뚝 떨어지더니 그가 합류한 2015년엔 전년 보다 11.5% 늘어난 5조 1,460억원을 기록해 ‘미켈레 기적’을 이뤄냈다.
이 같은 ‘구찌의 혁신’은 ‘미켈레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며 위축됐던 명품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고상함을 추구했던 명품 브랜드들이 미켈레가 차용한 것과 같은 원색과 파격, 화려함, 위트, 로고를 어느 때보다 대담하게 활용해 SNS 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젊은 층과 노블함에 지쳤던 30~40대를 잡으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미켈레 효과’는 그만큼 CD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패션 CD는 브랜드 전반의 이미지와 스타일, 콘셉트를 창조하는 총감독 즉 브랜드의 간판으로 누가 CD로 오느냐에 따라 브랜드가 살고 죽는다. 특히나 과거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명품의 패션쇼가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온라인 SNS 플랫폼을 통해 공유돼 트렌드 패션계 소식을 시시각각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CD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각 브랜드 별로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브랜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정도다. 한 패션 카페에서는 “올해 발렌시아가 CD로 발탁된 스트리트 브랜드 ‘베트멍’의 디자이너 출신 뎀나 바잘리아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미 바잘리아의 첫 작품인 ‘스피드러너’나 ‘볼캡’의 디자인은 ‘후덜덜’하며 하이앤드 스트리트 패션 슈즈의 꼭짐점을 이룬다”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챤 디올도 CD가 바뀌면서 상승세를 탔다. 사실 디올은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브랜드지만 그건 자기네들끼리 얘기고. 명품에 가장 민감하다는 한국 소비자의 마음은 사지 못한 ‘왕년의 브랜드’다. 그러나 올해 발렌티노를 떠나온 디올 최초의 여성 디자이너인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등장으로 디올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만하다. 이미 그의 첫 번째 콜렉션인 슈즈 스트랩에 ‘JADIOR(쟈디올)’이 들어간 쟈디올 슈즈 ‘슬링백’은 국내 재고가 없는 상태. 한 패션 블로거는 “웨이팅도 싫고 남들 다 신은 후 싫증났을 무렵 뒤늦게 매장에 재입고 되어 사 신는 건 더더욱 싫다”며 “조금 웃돈을 주고라도 일본에서 맞는 사이즈를 공수했다”고 털어놨다. 마크 제이콥스 시절 ‘3초백’ 불명예로 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루이비통은 2014년 니콜라스 제스키에르를 긴급 수혈함으로써 장인정신을 앞세우느라 너무도 무거웠던 디자인을 탈피하고 보다 가볍고 트렌디해졌다. 제스키에르는 얼마 전엔 ‘뒷골목 패션’으로 불리는 중가 캐주얼 브랜드 ‘슈프림’과 손잡고 골목밖으로 나오는 시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벌써 지쳐버린 제스키에르가 루이비통과 결별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오는 4월에는 끌로에의 CD도 새로 온다. 클레어 웨이트켈리의 후임으로 루이비통의 시니어 디렉터인 나타샤 램지 레비가 내정됐다. 끌로에는 자신감, 단호함, 차분함을 갖춘 여성의 아름다움과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명품에 비해 임팩트가 강하지 않아 주목도가 약하다. 그러나 제스키에르의 오른팔이던 레비가 이름 값을 하고 ‘미켈레 효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하반기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