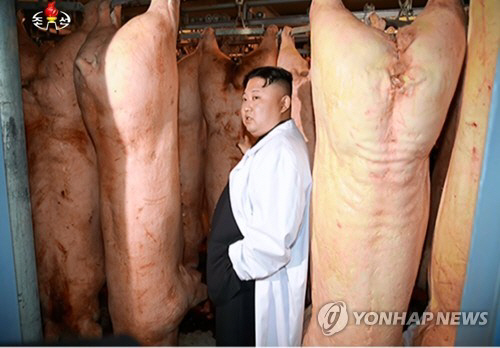북한에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장악력을 약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경제가 성장하면서 북한 정권의 사회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북한의 경제성장과 체제 결속력의 상관관계를 짚었다. NYT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래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연 1~5%의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활력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후반 국제적 고립과 극심한 가뭄에 따른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는 사실상 종결됐다. 이후 장마당(시장), 텃밭 등 시장경제가 북한 사회를 파고들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시장 수는 배로 늘어 404개에 이른다. 인구 2천500만 명 가운데 시장에서 상인과 관리자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10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식 시장들도 번성하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암시장 등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나 남한의 드라마는 물론 북·중 접경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도 팔고 있다. 북한 정권은 국영 기업들의 거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북한이 극도의 가난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김정은 정권은 시험대에 올랐다. NYT는 “계급이 없는 사회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시장의 힘을 번지는 것은 김정은에게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사기업의 팽창을 허락함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한 북한 정권의 근본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1980년대 중국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할 때의 조치들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고유 방식의 경제 관리”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시장의 힘이 북한 정부의 사회 통제력을 밀어내는 징후들은 이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NYT는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 이념의 유입이 김정은과 그의 일가를 향한 숭배심을 갉아먹고 있다며 “필요한 제품들을 국가 경제 밖에서 얻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권에 덜 신세를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북자들도 시장의 발달에 따른 충성심 약화를 얘기한다. 탈북자 김진희 씨는 “‘만약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하면 시장을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게 정부를 대하는 북한 주민들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북한 요덕정치범수용소 출신인 정광일 ‘노 체인’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를 항상 ‘위대한 지도자’나 ‘장군님’으로 불렀다”며 “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김정은은 그저 ‘그 아이’라고 부른다. 그(김정은)를 두려워하지만 존경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