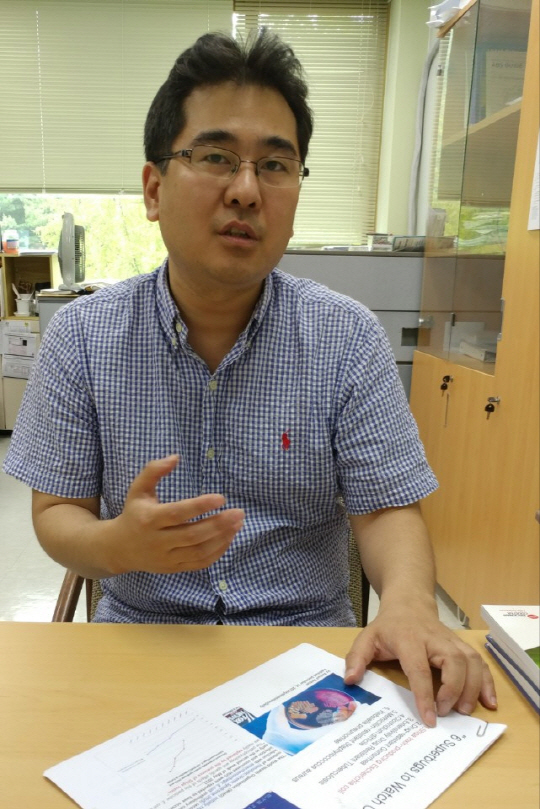“‘이질’ 등 대장균 감염병이 후진국병이었다면 ‘햄버거병’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무승 텍사스주립대 미생물 분자병리학 박사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햄버거병을 일으킨 대장균은 이질 등과 달리 감염경로가 다양한 ‘선진국병’”이라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13년 동안 신장조직과 면역세포 궤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1992년 미국 ‘햄버거병’ 발병 당시 사망 대장균을 밝혀낸 앨리스 오브라이언 텍사스대 교수의 연구팀에서 2005년부터 일하며 다양한 종류의 대장균 독성 효과를 직접 실험했다.
이 박사는 “일반적으로 동물성 대장균은 사람이 동물을 직접 먹거나 식물을 통해서 분변을 섭취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감염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후진국병’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제는 분쇄육 등 고기 정제 시스템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등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3차례 발병한 STEC대장균 집단발병은 모두 패스트푸드점 ‘잭 인 더 박스’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은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감염대상이었다.
이 박사는 “일반적으로 햄버거병의 식중독균은 일반 식중독균과 상당히 다른 종류”라며 “염증이나 설사만 일으키는 일반 균과 달리 STEC대장균(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은 독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햄버거병과 관련된 최근 사례에서 피해자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앓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장출혈성대장균 중 하나인 STEC(Shiga toxin-producing E.coli)라고 불리는 대장균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ColiO157, O159 대장균 등 STEC대장균은 체내에 들어가면 ‘시가 독소(Shiga Toxin)’이라는 병원성 독소를 배출한다. 독성이 높은 시가 독소는 신장 내부의 수용체와 결합한 후 신장 세포로 침투해 조직을 빠르게 괴사시킨다.
이 박사는 “STEC 대장균이 죽어도 체내에 배출된 시가 독소는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STEC균은 다른 대장균과 달리 10마리만 있어도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STEC균은 5분 동안 100도로 열을 가해야만 죽을 정도로 열에 강하다. 이 박사는 “2013년 독일 연구에 따르면 이 대장균들은 특정 장기에만 사는 게 아니라 혈류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망막과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신장세포의 수용체가 성인보다 많은데다 항체가 낮아 균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감염자가 1명뿐인데 ‘햄버거병’이라고 의심할 수 있을까. 이 박사는 “HUS라는 임상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US는 몸 안의 독소인 시가 독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다, 전체 대장균 중 강한 독소효과를 가진 병원균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 박사도 최근 국내 사례에서 HUS 진단을 전해 듣고 해당 질병이 STEC균 감염병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STEC균의 오염 경로는 다양하다. 동물의 장을 분쇄해 만드는 분쇄육도 오염 가능성이 높지만 고여 있는 물이나 충분히 소독하지 않은 야채 등에도 STEC균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독일에서 제대로 씻지 않은 야채를 먹은 5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WHO 통계에 따르면 STEC균으로 인한 발병률은 전세계 기준 해마다 112만 건에 이른다. 이 박사는 “육안으로는 STEC균 유무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병원을 찾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