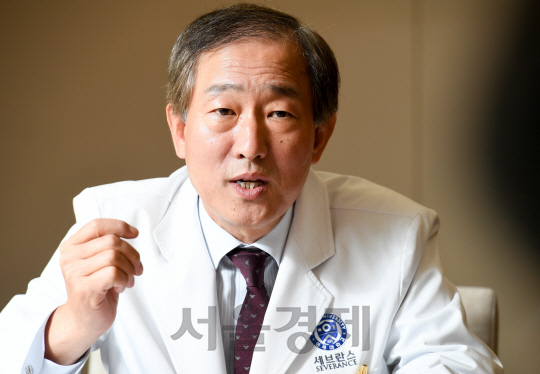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속에서 의료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이다.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병원을 총괄하는 윤도흠 연세의료원장도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오랜 고민 끝에 AI·사물인터넷·가상현실 기술 등에서 특화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과 협력해 질병 진단·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론을 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판단은 항암치료 부문에서 ‘AI 종양내과 의사’라는 별칭을 가진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산물이다. 윤 원장은 “왓슨 포 온콜로지는 암환자의 영상을 보고 스스로 진단하지 못하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어떤 항암제를 쓰는 게 좋다고 권고하는 수준의 초보적인 AI”라고 평가했다. 그는 “IBM 측은 우리나라 암환자의 데이터를 반영해 한국인에게 적합하게 보완하기보다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AI 상품을 파는 데만 관심을 보인다”며 “영원한 종속 대신 국내 연합군과의 협력을 통한 자력갱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미 10개 IT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역도 정밀의료 기반 아토피질환 예측 시스템, 센서 기반 척추질환 진단 시스템, 환자 수면평가 및 예측 시스템, 수술환자 생체신호 기반 회복개선 연구, 성인병 발생 예측 서비스, 당뇨병 예측 시스템 등 다양하다.
오는 2020년까지 파트너를 100곳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AI 의사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100개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꼭지 수를 늘려가다 보면 세브란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즉 ‘한국형 AI’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국내 IT 업체들이 개발한 서비스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기관·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의사들이 진단·진료·재활치료 등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제대로 개발하면 시장성도 작지 않다.
윤 원장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대학·병원과의 적절한 협력고리를 찾기 어려워 개발기술의 적용·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세대 의대·병원·연구소 등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와 연구인력, 임상 적용 능력 등을 협력기업에 개방해 의료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학 공동연구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겠다”고 자신했다.
이런 협업의 결과물은 연세의료원이 2020년 문을 여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에서 꽃을 피운다. 그 중심에는 연세의료원이 개발 중인 진료 및 병원운영 전산 시스템 ‘유비쿼터스 세브란스 3.0’이 있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이 연계된 디지털 병원이 탄생하는 셈이다.
정책당국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병원 전산 시스템(EMR)이든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이든, 의료 빅데이터든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통합센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특정 병원을 밀어주거나 몇몇 병원에 나눠주기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병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센터 방식으로 전환해야 표준화도 빨라지고 대형병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경쟁을 할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