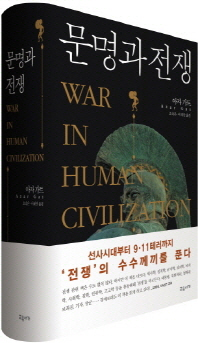인간은 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할까. 전쟁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발명품인가. 전 세계를 공멸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양차 대전과 같은 전면전은 줄어들었지만, 국지적인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쟁과 관련된 의문들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인류를 고민하게 만든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답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관련된 책들은 수없이 나왔지만, ‘문명과 전쟁’은 단순히 전쟁의 참상과 전쟁의 역사에 대해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 제목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전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명과 전쟁의 공진화(共進化)’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저자는 군사학은 물론이고 진화론, 진화심리학, 동물행동학 등 다양한 분과들을 연구했다.
전쟁은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는 우선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거친 200만 년 중 99.5%에 해당하는 199만년 동안 모든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수렵채집 생활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렵채집 사회에서 싸움과 연관된 인간의 본성과 동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살핀다. 저자에 따르면 동물의 생존 투쟁과 국가의 전쟁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 통념과는 달리 수렵 채집인의 싸움이 동물들의 싸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적의는 수렵채집 생활의 잠재적 분쟁 상태에서 비롯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명과 전쟁이 어떻게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설명하는 저자는 인류 역사 속 폭력의 감소 추세를 논증하면서도 ‘평화의 승리’를 점치는 섣부른 환상을 경고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인류의 역사는 오히려 ‘폭력의 승리’, 강한 폭력이 약한 폭력을 제압하고 대체해온 과정이다. 평화는 그 부산물일 뿐이다. “사회 안에서 폭력적 죽음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대개 폭력이 승리했기 때문이지 어떤 평화로운 합의 때문이 아니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핵무기의 귀결인 분쟁 자제는 군비 경쟁, 억지, 공포의 균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전면전의 억지력에 토대를 두는 ‘소극적 평화’보다, 공동 이익과 서로 공유하는 반전 규범에 뿌리박은 ‘적극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5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