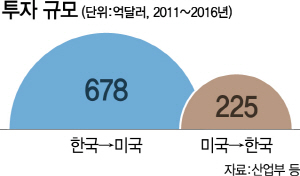한국과 미국의 재계 인사들이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친분을 쌓는 ‘한미 재계회의’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9회차를 맞은 연례행사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연일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는 와중이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다. 특히 미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와는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자체에 반대하는 미 재계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번 회의를 계기로 두 나라 재계가 공동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올해 회의는 예년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는 전언이다. 일단 미 정부 관계자는 물론 미국 측 위원장인 폴 제이컵스 퀄컴 회장마저 불참했다. 썰렁한 모양새는 둘째치고 우리 입장에서는 “결례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5년 재계 회의(27차) 때와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당시 회의 때는 미국에서 브루스 허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들렀다. 거물급이 참석했던 만큼 ‘알짜’ 정보들도 많이 오갔다.
재계에서는 양국 간 통상 마찰에 따른 불편한 관계가 이번 회의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을 넣는 와중에 당사자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재계회의에 참석하기에는 껄끄럽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도 “(우리 기업들이) 전방위 통상 압박으로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 관료를 직접 만나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실제로 한미 재계회의를 준비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통상 담당자들과 한미 재계 관계자들 간 면담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 정부 측이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기업의 참석 인사도 과거와는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과 삼성·LG·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미국 현지 사무소 대표급이 얼굴을 내밀었다. 반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제이컵스 회장은 불참하는 등 참석자 면면의 중량감이 이전만 못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 경영진도 미국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이런 여건상 올해 회의는 민간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산업계의 최대 고민거리가 다뤄진 ‘미국 통상 정책 및 한미 FTA’ 세션에는 총 5명의 연사가 연단에 올랐는데 한국 측이 4명이었고 미국 측은 1명뿐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정책을 주제로 토론하는데 한국 측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의 깊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 연사는 한미 FTA 산파 역할을 한 웬디 커틀러 전 FTA 협상 수석대표였다.
재계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보다 노골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LG 세탁기가 자국 산업 발전을 해친다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여건을 마련해줬다. 철강·섬유·기계 등에도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또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내년 4월 반덤핑 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연례심사를 통해 최대 46%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예비판정도 내렸다. 한미 FTA 재협상 국면을 맞아 연일 통상 압력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수입 규제국에 등극했다. 수입 규제 개수는 31개(지난 9월 기준)에 이른다. 이는 ‘규제 왕국’으로 통하는 인도의 규제 개수와 같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