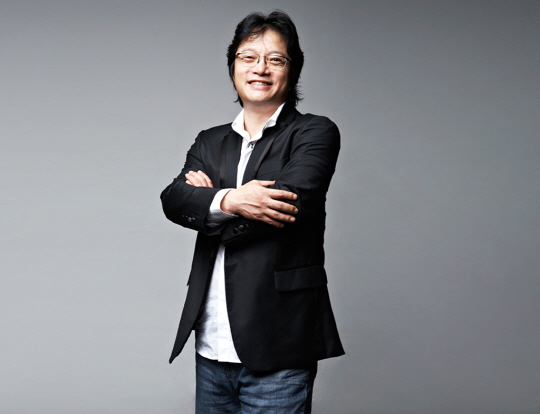“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오페라는 박물관으로 들어갈 겁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라벨라 오페라단의 이강호(52·사진) 단장은 오페라계에서 ‘쓴소리꾼’으로 통한다. 민간오페라단인 라벨라를 이끈 10년간 그는 순수예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없는 정부, ‘오페라 대중화’라는 미명 아래 저품질 작품을 쏟아낸 오페라계를 향해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국내 오페라계가 하루빨리 변하지 않으면 그간 쌓아온 토대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15일 서울 서초동 라벨라 오페라단 연습실에서 만난 그는 “20년 후면 세계 극장의 절반은 한국 성악가가 차지할 텐데 국내에선 성악가를 체계적으로 키울 무대가 없으니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국립오페라단마저도 작품을 올릴 때마다 연출과 지휘자, 주역급 성악가들을 해외 출신으로 채우니 신진 오페라 가수나 지휘자가 설 무대가 턱없이 부족하다. 공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오페라는 한 번 제작한 작품을 오랜 기간, 여러 지역에서 선봬야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서울조차 장기 대관이 가능한 공연장이 전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연 유치 의지도 부족하다는 게 이 단장의 지적이다.
촉망받는 성악가였던 이 단장은 “실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한국 성악가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라벨라를 창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10년간 라벨라를 운영하면서 지켜온 철칙 중 하나가 해외 유명 극장의 내한이나 해외 성악가를 내세운 작품은 무대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악가는 물론 연출가나 지휘자도 한국 출신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오페라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물론 이 단장은 “국내 성악가와 제작진들만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한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팝을 보세요. 팝은 서양 문화지만 우리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한국 성악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걸 보면 한국이 오페라 종주국이 되지 말란 법은 없죠.”
2011년부터는 정기 오디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해 무상으로 교육하고 이중 우수한 성악가들을 스튜디오 단원으로 선정,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순수 국내파, 뿌리 깊은 학연·지연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성악가들 중에도 뛰어난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악가가 예술의전당 같은 1급 무대에 설 수는 없죠. ‘2급 극장’에서 공연하면서 실력을 쌓고 검증 받은 가수들이 1급 무대로 진출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이 단장은 라벨라를 ‘믿고 보는 오페라단’으로 키웠다고 자부한다. 도니제티 오페라 ‘안나 볼레나’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세니에’ 등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작품을 소개하는데 앞장섰고 지난해 소극장 버전으로 선보인 ‘돈 지오반니’는 전석 유료 관객으로 매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단장은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아 17~2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그랜드 오페라 버전의 ‘돈 지오반니’를 선보인다. 정선영 연출가와 양진모 지휘자의 진두지휘 아래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강혜명, 국립오페라단 ‘오를란도핀토파쵸’에서 호평을 받았던 바리톤 우경식 등이 출연한다. 라벨라 스튜디오 단원들 가운데서도 레포렐로 역을 맡은 베이스 양석진을 포함해 총 4명의 단원이 무대에 선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이 단장은 2022년을 목표로 자체 극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단장은 “좋은 오페라가 만들어지려면 수년간 업그레이드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극장이 부족해 재연조차 어렵다”며 “모든 오페라단이 극장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