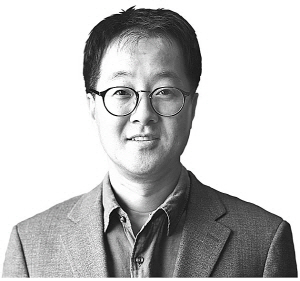지난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다. 초등학교 5학년 소년은 5,000원이 꼭 필요했다. 부모님께 떼써서 받은 돈을 들고 당도한 곳은 모 프로야구단의 어린이회원 모집처. 회비를 내고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친 소년은 야구단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받았다. 가방 속에는 점퍼와 티셔츠·모자·팬북·연필·스티커·사인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2017년 12월. 일명 평창 롱패딩과 평창 스니커즈의 열풍을 보며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평창 롱패딩은 최근 3만벌 완판을 기록했다. 평창 스니커즈도 사전예약 일주일 만에 주문이 초기 물량 5만켤레를 넘어섰다고 한다.
평창 기획상품인 ‘평창 굿즈(goods)’가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50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관심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성화의 불꽃도 열기를 좀체 높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열차로 평창과 강릉을 방문하는 등 정부도 평창 띄우기에 나서고 있으나 강원도와 이외 지역의 올림픽 온도 차는 큰 게 사실이다.
평창 굿즈의 인기를 두고 일부에서는 엉뚱한 곳의 열풍이 올림픽 붐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짝’ 현상이라고 치부한다. 소비자의 모방심리, 그리고 유행을 부추겨 매출 증대를 노리는 패션 업계의 마케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평창 롱패딩은 ‘올림픽’과 ‘열풍’을 묶어 회자하는 거의 유일한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북핵, 도핑, 보이콧, 테러 위협…. 기성세대가 접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연관 단어 중에는 부정적인 게 많았다. 그런가 하면 ‘평화 올림픽’은 차원 높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추상적이고 현실과 괴리가 큰 슬로건이다. 반면 패딩과 스니커즈·백팩은 상품 그 자체로 평창이다. 피부에 와 닿고 수요층의 요구에도 맞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올림픽 열기를 걱정하는 질문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대답은 올림픽 홍보의 일면을 드러내는 듯했다. “대회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첫 메달이 나오면 달라지겠지요.”
아직 시간은 있다. 어쩌면 평창 롱패딩 열풍에서 붐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키워드는 유소년, 구체적 메시지, 생활 밀착, 눈높이, 가성비 등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미래세대인 유소년에 올림픽의 가치를 두고 고민해보면 흥행 이외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성공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유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의 말에 귀 기울일 만하다. “올림픽 홍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데 올림픽에 편견이 없는 유소년을 타깃으로 소통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현재의 기성세대가 누리듯 유소년은 평창올림픽 유산을 물려받을 세대이기도 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올림픽 홍보는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의 추억을 심어 소속감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의 야구 팬들이 어린이 회원 선물의 강렬한 추억과 함께 35년간 프로야구를 지탱해온 것처럼 말이다.
m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