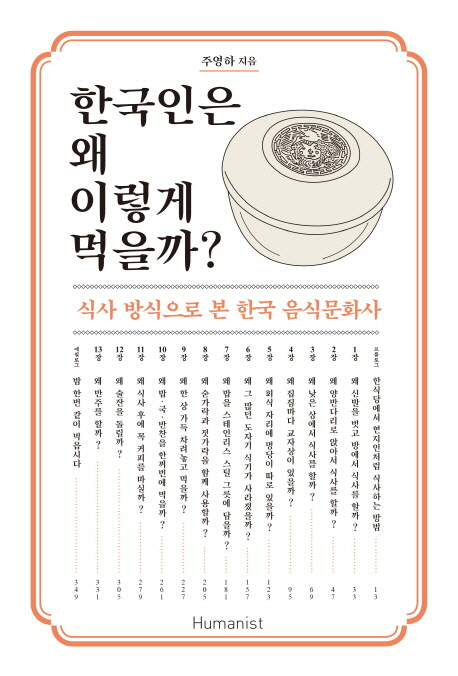우리나라 고유의 식사양식으로 커다란 탕에 각자의 숟가락을 넣어 떠 먹는 ‘공유식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식사양식이 생긴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선조들은 1인용 식탁인 ‘소반’을 사용했다.
오늘날 한정식집에서 사용하는 웅장한 교자상에 비하면 ‘소반’은 밥은커녕 걸터앉기에도 비좁고 낮아 보인다. 이런 ‘소반’ 문화는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적폐로 몰린다. 1927년 2월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음력설 명절과 고쳐야 할 풍속’이라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소반에 따로 음식을 차려 몇 번이고 상을 내느라 고생하느니 커다란 교자상을 사용해 부인들의 수고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식기 또한 급변했다. 1960년대 전통적인 놋그릇은 촌스러움의 상징이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스테인리스 그릇. 놋그릇은 연탄의 일산화탄소에도 쉽게 변색됐지만, 스테인리스는 가볍게 닦기만 해도 광택을 유지했다. 당시 스테인리스 그릇은 도시노동자 월급의 3분의1에 달할 정도로 고가였고, 상류층은 식기뿐 아니라 제사상도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했다. 더 이상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오늘날, 부부용 삼첩반상 놋그릇 세트의 가격이 ‘무형문화재’라는 이름 아래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저자는 이런 식사 습관의 변화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생긴 신자유주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식사양식의 변형에는 100여년 동안 한반도에서 급격하게 이뤄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행하는 ‘혼밥’과 ‘혼술’ 역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식사양식이다. 저자는 이 현상이 한국사회가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집단주의적 ‘함께 식사’를 강요해온 것에 대한 반발이라 설명한다. 젊은 층이 규범적인 ‘함께 식사’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찾기 위해 식사자리를 떠난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식사로서의 음식은 일상이지만, 문화와 역사로서의 음식은 그 사회를 드러내는 인문학이다.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