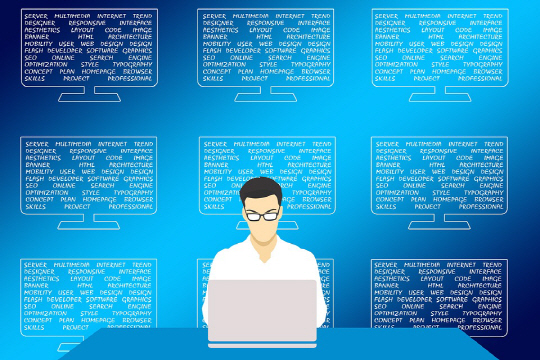영미권 유력 매체들이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기본요소로 꼽히던 댓글 기능을 잇따라 없애고 있다. 악성 댓글이 넘쳐 이용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유명 언론연구 기관인 미국 하버드대의 ‘니먼랩’에 따르면 시사 매거진 디아틀란틱(The Atlantic)은 최근 언론사 웹사이트의 댓글 기능을 없앴다. 대신에 우수한 독자 의견을 모아 ‘투고’(Letters) 섹션에 발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적 약자 혐오나 허위사실 등 각종 악성 댓글이 쏟아지지만, 기자들이 이를 일일이 정리할 수 없어서 내놓은 조치다. 다만 디아틀란틱 측에 따르면 기사에 관한 여론 수렴은 필요한 만큼 우량 독자 의견은 최대한 많이, 자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댓글 기능을 없앤 유력 영미권 매체는 적잖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며 기사에 관한 토론은 SNS에 맡겨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11월 댓글 폐지 선언을 한 로이터 통신사다. 로이터는 “기사를 둘러싼 논의와 비평 활동 다수가 이미 SNS와 온라인 포럼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우리 기사에 관한 논평은 이제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계정으로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밖에도 댓글을 폐지한 사례로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사 NPR, 유명 테크놀러지 전문 매체인 리코드(Recode), 미국의 유망 인터넷 언론사 ‘마이크’(Mic), 유력 과학기술 매체인 ‘파퓰러 사이언스’ 등이 있다.
댓글은 애초 기사에 관한 외부 의견을 모으는 장치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는 ‘뉴스는 안 읽고 댓글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 콘텐츠가 됐다. 특히 국내에서 네이버·다음 등 양대 포털의 댓글은 주요 여론 지표로 꼽힐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최근엔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수사까지 벌이고 있다.
댓글을 유지하는 국내외 매체들도 악성 댓글 걸러내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기사의 댓글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독자가 추천한 댓글’ ‘NYT가 뽑은 우수 댓글’을 따로 보여준다. 네이버는 작년 2월 네티즌에게서 받은 ‘공감’과 ‘비공감’ 수 총합에서 공감의 비율이 높은 댓글을 상단에 올리는 제도를 선보였다. 한쪽의 극단적 시각을 거칠게 강조한 악성 댓글이 순식간에 공감 ‘몰표’를 받아 상위에 부각되는 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는 그러나 사용자 등 일각에서 ‘비율 산정 등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뜻밖의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폐지됐다. 현재 네이버는 공감에서 비공감을 뺀 수치에 따라 댓글을 배열하고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