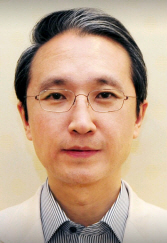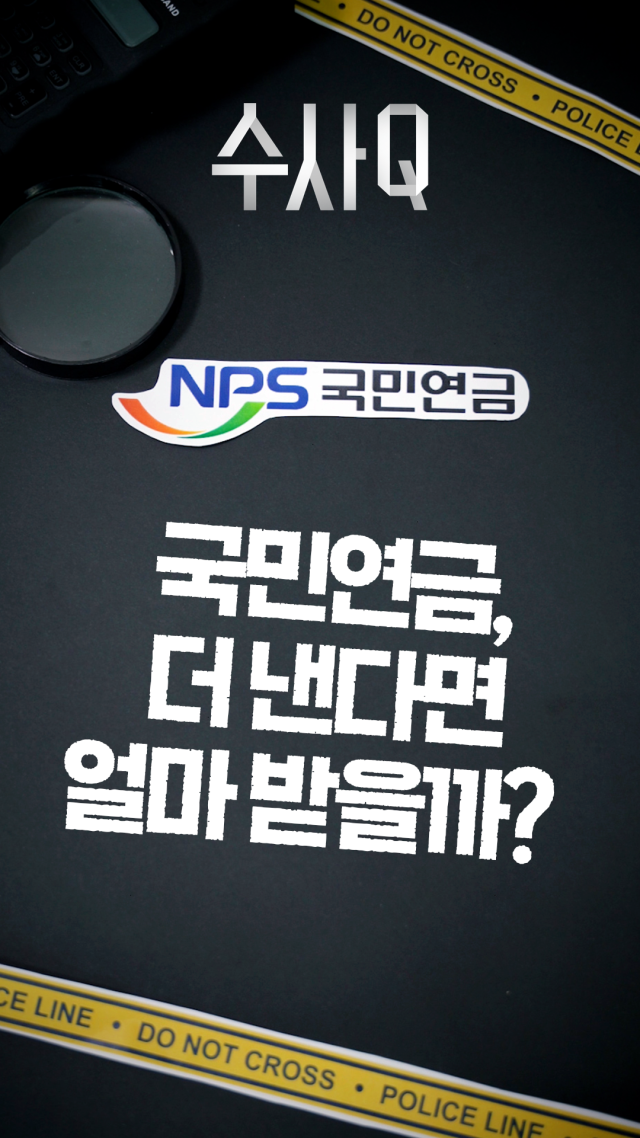정부가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지나치게 줄여 치매·뇌졸중·뇌전증·파킨슨병 환자들이 갈수록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추신경(뇌·척수), 말초신경, 근육의 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신경과 환자의 70~80%는 노인이다. 4대 신경계 질환 가운데 치매·뇌졸중·파킨슨병은 주로 60세 이후에 발생한다. 뇌전증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노인 인구는 2배가량 늘었다. 그런데 노인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신경과에서 매년 뽑는 전공의 수는 최근 5년간 20명 이상 줄었다. 응급실을 찾거나 병실에 입원한 신경과 환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1,000~2,000 병상급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의 1년 차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2~3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5~10명인 미국·일본의 1,000 병상급 종합병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신경과 환자는 2,000명가량 된다. 전공의가 없거나 부족하면 적정 응급치료가 늦어지거나 어려워진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치매 등 노인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신경과 전공의 수를 줄여놓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를 포함한 부모 세대의 질환에 더 큰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신경과 전공의 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업무량이 많은 신경과 전공의 정원이 연차당 2명뿐이다. 검사의 종류와 진료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 정원의 절반이다. 신경과 전공의는 응급실 환자뿐만 아니라 중한 입원 환자, 외래 환자들을 진단·치료하는 법을 배우고 각종 검사(뇌파·근전도·신경전도·뇌혈류·수면다원·신경심리·어지럼증·유발전위 등)와 인지행동치료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환자들을 진료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그런데도 전공의가 될 인턴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후기 전공의 모집 후 시행하는 추가 모집을 비인기과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올해 전·후기 모집에서 떨어진 인턴 의사 320명 중 50명(16%)만 지원했다. 5개 대학병원은 전·후기 모집에서 신경과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했지만 추가 모집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이들을 수련하는 대학병원 등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270명의 인턴 의사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에서 인턴 의사의 84%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자원정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인기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원하는 전문과 지원을 막는 것은 불평등하고 비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전공의 정원 배정과 추가모집 제도는 매우 비민주적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특히 응급실 환자들이 많은 신경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의 적정 진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공의 교육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원하는 전문과를 못 가게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안다. 미국과 일본은 전·후기 모집에서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언제라도 추가로 뽑을 수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신경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줄인 전공의 정원을 다시 늘려야 한다. 그래야 노인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