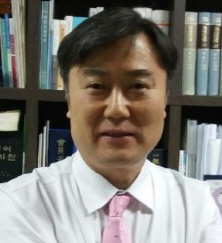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원하든 말든 항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부대끼고 살다보면 서로 어울려 협력할 때도 있지만, 부딪히고 싸울 때도 많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숱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면 평화로운 삶이 어렵다.
그러면 그 갈등과 대립은 어떻게 해소될까? 주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립과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조용히 해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상식과 도덕에 따라 이뤄진다. 그렇지만 상식과 도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득이 제3자의 손에 의해 법으로 해결된다.
그런데 상식과 도덕에 따른 갈등과 대립의 해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평화롭게 이뤄지지만, 제3자의 손을 빌어 법으로 해결되는 일은 수사나 재판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은 사건의 과정을 잘 아는 당사자가 아무 것도 모르는 심판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라 자기편이 없거나 조리 있는 설명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런데다 시간과 비용과 많이 들어 배(소송의 목적)보다 배꼽(소송비용)이 더 클 때도 많아 없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하물며 삶의 어려움이라고는 도통 모르는 책상물림에게 심판이 맡겨진다면, 과연 당사자들이 그 심판에 쉽사리 승복할까?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에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감옥에 가득하고, 법적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지경이다.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을 책임 진 법무부부터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돌이켜보건대,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 살다보면 누구나 무심코 꺼낸 뒷담화, 공연한 의심이나 미움, 짓궂은 장난이나 농담, 어설픈 자기과시, 섣부른 애정표현, 순간적 분노나 짜증을 범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뜻하든 않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준다. 어쩔 땐 잘난 척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원한과 질시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다툼은 다행스럽게도 99% 이상 당사자 간 상식과 도덕에 따라 자연스레 해소되고, 나머지 1% 미만이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해소된다. 그렇다면 상식과 도덕이야말로 인간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근본규범이며, 법이란 상식과 도덕의 빈틈을 채우는 보충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고, 무작정 법부터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오죽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너랑 상대 안 해’, ‘누가 센지 함 붙어보자’는 말로 들릴 지경일까? 이런 식이면, 법은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데는 법률가를 비롯한 권력의 잘못이 크다. 우리나라의 권력이 지금껏 수사나 재판에서 절차적(증거적),부분적 진실을 과장해 실체적, 전체적 진실추구이라고 큰소리치고, ‘정의의 파수꾼’을 뛰어넘어 주제넘게도 ‘정의의 건설자’를 자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악의 발본색원(拔本塞源·폐단의 근본원인을 뿌리 채 없애버림)’을 외치며, 이를 위해서라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명이나 인권 쯤은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시킨다’는 구실로 짓밟아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범죄를 낳는 사회적 폐단은 본래 수사나 재판만으로는 근본적인 제거가 불가능하다. 정치의 부패, 사회도덕의 붕괴, 상식이 불통인 사회에서 아무리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들 윗물이 혼탁한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길 기대한단 말인가?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악의 발본색원’이라는 말은 사회악의 원인을 개인에게 모두 전가시킴으로써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법의 모순과 한계를 인식하고, 법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상식과 도덕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법의 제정과 운용을, 백성들과 멀리 있는 소수의 책상물림에게 맡겨둔 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법이 상식과 도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감시의 눈을 번득여야 한다. 가끔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2,000년 전 로마법의 격언을 되새기면서./문성근 법무법인 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