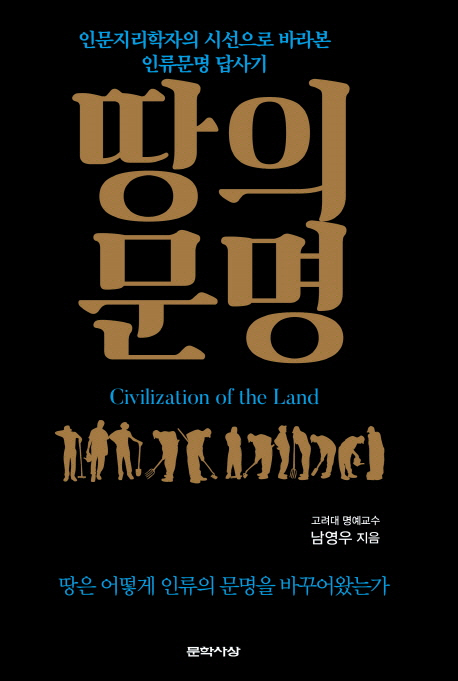땅 얘기에 앞서 땅에서 태어난 문명의 이기(利器) 자동차 얘기부터 들어보자. 같은 시기,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독일의 벤츠와 미국의 포드 자동차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독일의 카를 벤츠는 1886년 1월29일 마침내 자동차 발명에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말(馬)없이 덜덜거리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쉽게 마음도, 지갑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카를의 아내 베르타가 나섰다. 홀로 만하임에서 포르츠하임까지 약 100㎞를 자동차를 몰고 가기로 했다. 여자 혼자 장거리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자동차의 ‘대단함’을 사람들이 알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운전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자 베르타는 가까운 약국에서 석유 용제의 일종인 리그로인을 구입해 자동차에 주입해 다시 달렸고, 이 약국은 ‘세계 최초의 주유소’로 불리며 지금도 영업 중이라 한다. 같은 시기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에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헨리 포드도 자동차를 발명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내 자동차 도로가 마차 도로를 압도했다. 도로 건설과 함께 신호등과 주유소가 함께 세워졌다.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사고 발생도 늘었으니 교통경찰, 병원, 그리고 보험회사와 자동차 수리소가 생겨났다. 연료 수요가 커지니 유전발굴이 활성화됐고, 자동차 보급 증가는 생산과 경영방식도 바꿔놨다. 결국 자동차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는 도시 전체를 성장시켰다.
‘인문지리학’ 분야의 거장인 남영우 고려대 명예교수는 인류문명 답사기 성격의 신간 ‘땅의 문명’을 시작하며 “우리가 벤츠와 포드의 사례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땅에서 새로운 문명이 창출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문명론으로 700쪽을 훌쩍 넘긴 두툼한 책이지만 전문학술서는 아니다.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에게 문명, 로마문명, 미국 문명 등을 세심하게 짚어주되 “문명의 창출 메커니즘을 땅의 생김새인 지절(肢節)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땅의 생김새는 평면적으로 볼 때 해안선의 만입 상태가 풍부해 드나드는 것이 복잡한 지형과 단면적으로 볼 때 평지와 산악의 굴곡이 다양한 지형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것을 ‘지절’이라 부르는데, 이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수록돼 있고 일제강점기 종교사상가이자 지리학자인 김교신의 논설집에도 등장한다.”
여기서 착안한 저자는 지형적 다양함과 복잡함의 정도를 의미하는 ‘지절률(sinuosity ratio)’을 적용해 문명 탄생의 원리를 분석했다. 단 국지적 접근보다는 대륙적 스케일로 접근했을 때 지절률과 문명발생의 높은 상관관계가 더욱 분명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 부근 등 인류의 역사가 그 사례다. 복잡한 해안선과 여러 개의 반도로 이뤄진 유럽 대륙은 이탈리아·이베리아·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발칸반도 등이 각자의 언어와 민족 정부를 갖고 있다. 이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저서 ‘총,균,쇠’에서 중국의 만성적 통일과 유럽의 만성적 분열 원인을 ‘땅의 생김새’에서 본 것과 유사한 주장이다.
간단한 원리 설명 후 저자는 구대륙에서 출발해 역사의 전개를 따라 문명의 발생지로 답사를 떠난다. 마지막 9장은 ‘태평양 시대의 문명 중심’을 묻는다. 역사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았듯 인류 문명은 ‘하천형 문명’에서 ‘해양형 문명’으로 옮아갔기에 지금 태평양, 특히 동아시아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는 ‘지절률’을 적용해 한반도와 구대륙의 중심 메소포타미아 지역, 에게문명을 낳은 펠로폰네소스와 발칸반도,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을 비교한다. “한반도 정도 크기의 땅이라면 하나의 독자적 문명이 창출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의 자신감을 북돋운다. 한반도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위해 어떤 정책과 가치를 강조해야 할지는 독자에게 던져진 숙제다.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