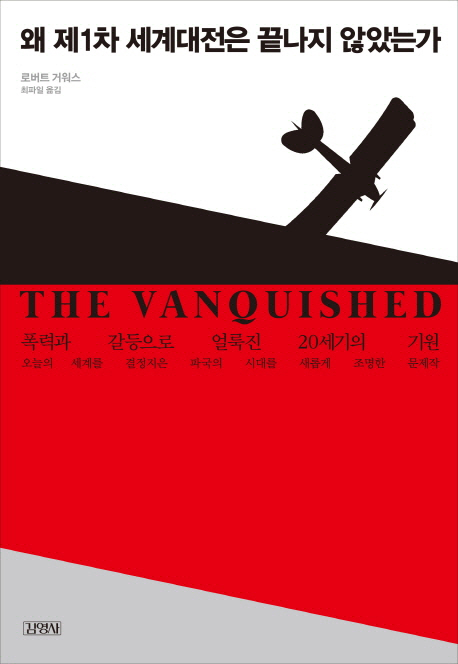오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지 100년 되는 날이다. 책은 1,000만 명의 전사자와 2,000만 명의 부상자를 낳은 사상 최악의 ‘대전’이 과연 독일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100년 전 그날 종지부를 찍었느냐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대전 종식 이후 패전국에는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혁명과 반혁명, 내전과 분쟁이 자리 잡았고 새로운 폭력의 논리가 유럽 대륙을 빨아들였다. 유럽이 지구 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공간으로 남겨진 배경에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서 대전 이후 세계를 조망한 편협한 역사관이 있었다. 저자는 서유럽 못지않게 패전국 지역에서도 다양한 정치 실험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유독 정치적 격변을 겪은 이유로 러시아에서 불어닥친 볼셰비즘에 대한 공포를 지목한다. 패전 이후 자리 잡은 정신적 붕괴 속에 히틀러, 무솔리니가 탄생했고 전체주의와 인종주의가 똬리를 틀었다.
책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등 패전국이 직면한 전후 세계에 초점을 맞춰 ‘끝나지 않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유산을 세밀하게 파고든다. 잘못된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제대로 되짚는 과정이 필요하다. 승전국 중심의 영토재편이 낳은 내전과 민족분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