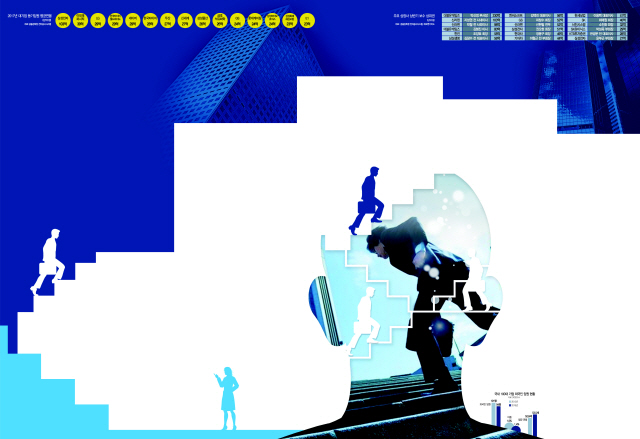대기업 인사 관련 담당자들이 임원 승진 기준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역시 ‘능력’이다. 대개 입사 이후 임원 승진까지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 기간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 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적어도 이사나 상무 등 초급 임원 자리에 오르려면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임무수행능력이겠지만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나 인간관계 등도 임원 승진에 있어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하향식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상사에게만 인정받으면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면평가제도가 확산하면서 자신의 팀원과 회사 직원들의 평가도 중요해졌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이 쉬워지고 온라인상의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도 많아지면서 평판 관리는 임원 승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가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한 대기업 계열사인 A사에서는 지난해까지 유력한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 올해 들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해 초부터 해당 인사의 임원 시절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내에 확산됐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발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연과 학연이 중심이 된 소위 ‘줄(라인)’은 임원 승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특정대학교 라인이라든지, 오너의 처음 입사한 회사 출신들이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합병 기업의 경우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출신 간의 알력도 적지 않다.
특히 은행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은행권은 여러 은행이 합쳐져 탄생한 ‘메가뱅크’가 많아 임원 인사 때마다 출신 은행이 거론된다. 4대 시중은행을 보면 KB국민은행은 주택은행·장기신용은행·국민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했으며 신한은행은 조흥은행과 합쳐 몸집이 커졌다. KEB하나은행도 비교적 최근 외환은행을 품었고 우리은행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지역 연고주의가 강한 지방은행도 마찬가지다.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행장이 채용비리로 사퇴한 뒤 차기 행장 자리를 두고 경북고 라인과 대구상고·영남대 출신의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사 시즌만 되면 은행 내부 파벌로 나뉘어 신경전이 치열해진다”면서 “지난해부터 다른 산업과 달리 은행권을 중심으로 채용비리가 터진 것도 파벌 문화에 기반을 둔 내부 고발이 한 원인”이라고 전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외국인 임원들이 발을 못 붙이는 것도 이런 ‘라인’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 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100대 기업(매출 기준)의 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6,843명 중 외국인은 94명(1.4%)에 불과했다. 스카우트된 외국인 임원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부장이나 팀장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데 부·팀장들은 낙하산처럼 떨어진 외국인 임원들과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자신의 손발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힘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어차피 몇 년 있다 떠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임원들을 위해 일을 하기 싫어하는 문화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김기혁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