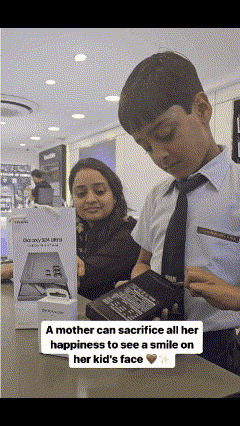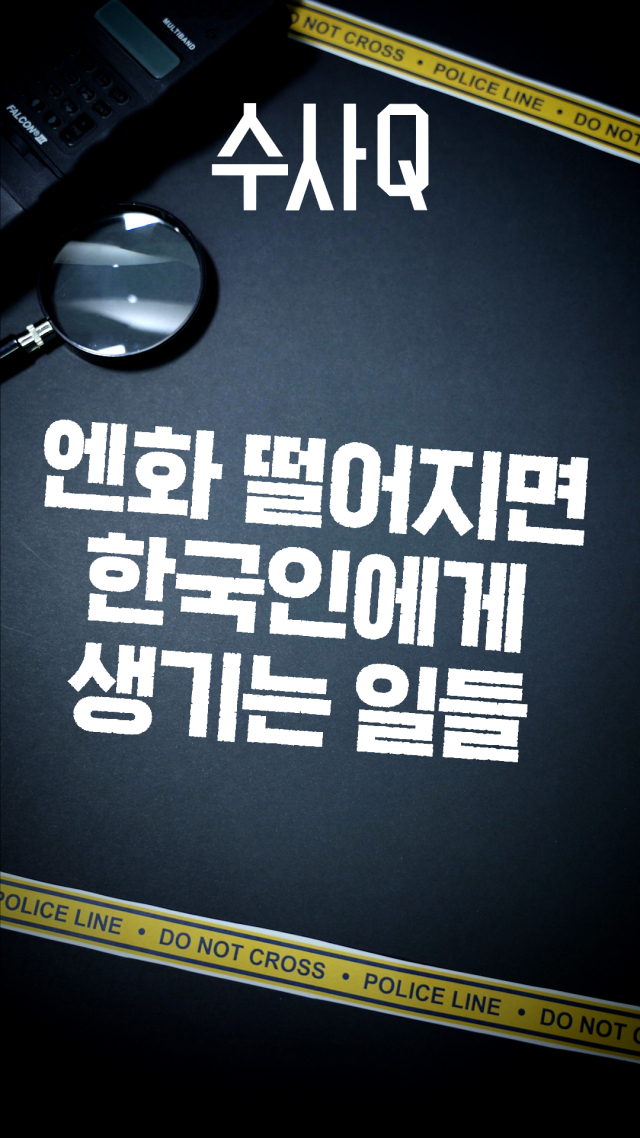“임금 인상은 생산성 증가를 동반해야 합니다.”
지난 4~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2019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지적은 우리 주력산업의 현실 극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성 요소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경제 전체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로머 교수는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자원을 빼앗아 임금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주력산업이 붕괴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이 꼴찌 수준인 자동차 산업의 인건비 상승은 자동차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무너지게 한다. 한국 5개 완성차 기업들의 자동차 한 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은 평균 26.8시간. 일본 도요타 24.1시간, 미국 제네럴모터스(GM) 23.4시간보다 훨씬 많다. 자동차뿐만 아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생산성 저하에 신음하고 있다. 생산성 저하의 첫 번째 원인으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경직된 노사관계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2015년=100)는 지난해 3·4분기 기준 109.4까지 올랐다. 단위노동비용은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대개 단위노동비용이 오르면 생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기술 개발이나 투자, 경쟁 환경 등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만 한국의 경우 급격한 임금 상승 등 노동 이슈가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생산성과 임금은 비례해야 한다”며 “실적이 증가해야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성 검토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해 존폐 우려가 있지만 사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한국 노사관계가 새로 정립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원형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과 미국 GM의 ‘새턴 프로젝트’다. 아우토 5000은 새 공장을 지어 기존 임금의 80% 수준에 주당 근로시간 최대 48시간인 일자리 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으며 새턴 프로젝트는 기존 GM 평균 임금의 90%를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호봉제를 폐지한 새턴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인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팎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서두른 탓에 실패 위기를 겪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결국 이 사업이 표류하는 결정적인 원인 역시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생산시설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지만 국민들의 눈에 비친 것은 거대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에 가까웠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지만 적절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한정 늘릴 수만 없다”며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는 방식의 빅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내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법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는 총 6만8,315건이 개최돼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 노동 분야 집회가 3만2,275건으로 증가 폭(73%)이 가장 컸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나 정치 참여가 예전보다 부쩍 개선됐지만 길거리로 향하는 노조의 발걸음은 더 늘었다는 의미다. 조만간 자동차 산업에서는 처음으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예정이다. 자리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기업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양새다. 노조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요구와 거부, 반발과 퇴장’으로 이어지는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는 ‘촛불 채무’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강경한 모습”이라며 “노조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