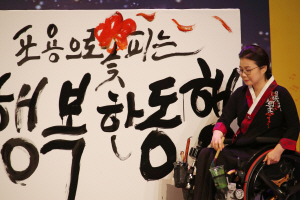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A씨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은 마음에 중소기업에 지원했다가 석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가 당초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급하게 채용에 나선 해당 기업은 실제 지원하는 장애인을 보고 업무를 배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모르고 지원한 A씨는 기대와 달리 단순 서류 검토 업무를 해야 했다. A씨는 고심 끝에 사직서를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건 ‘이래서 장애인을 뽑으면 안돼’라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한국의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민이 ‘내가 죽고 나면 내 아이는 누가 돌보느냐’다.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자립조차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30여년 간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단기 고용에 주로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자립의 시작인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을 국가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는 86만명으로 전년 보다 3만여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는 24만명 증가한 것에 비춰볼 때 정반대 흐름이다. 문제는 정작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도 ‘땜질식 고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뇌병변 장애 5급인 B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회사에서 처음 제시한 월급 180만원에서 20만원을 깎겠다고 하면서다. B씨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는 월급 인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경증의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C씨는 지난해 웹디자이너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6개월도 안 돼 그만뒀다. 비장애인이 세 시간 걸려 할 일을 C씨가 여섯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 이유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던 회사는 C씨에게 야근수당까지 줘야 하자 부담을 느끼고 결국 해고 카드를 내밀었다.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 지 28년이 흘렀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4%를, 민간기업은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고용한 장애인 인원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거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고용한 뒤 장애인이 그만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은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관, 단체에서도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전공을 고려해 취업을 알선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장애인의 근속 연수가 짧다”며 “실업률도 높은데 장기근속까지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