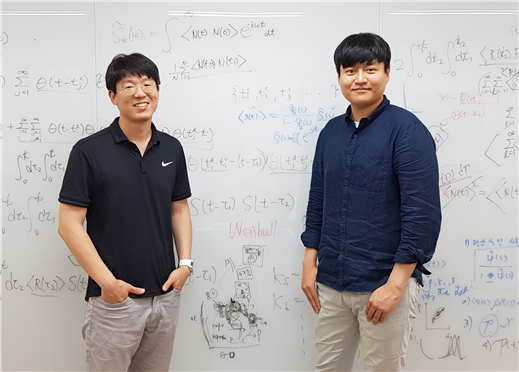KAIST(총장 신성철) 수리과학과의 김재경 교수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장청 박사 공동연구팀이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간 발생하는 차이를 수학 모델로 해결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높였다. 동물과 사람 간 차이뿐 아니라 사람마다 발생하는 약효의 차이 발생 원인도 밝혀냈다. 김대욱 박사과정이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분자 시스템 생물학’ 7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수면장애는 맞춤형 치료 분야에서 개발이 가장 더딘 질병 중 하나이다. 쥐는 사람과 달리 수면시간이 반대인 야행성 동물이다 보니 수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가 실험 쥐에게는 효과가 있어도 사람에게는 무효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아 신약 개발에 애로가 많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미분방정식을 이용한 가상실험과 실제 실험을 결합해 연구했고 사람은 야행성인 쥐에 비해 빛 노출 때문에 약효가 더 많이 반감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빛 노출 조절을 통해 그동안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약효가 발현되게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수면 장애 치료 약물의 약효가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신약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연구팀은 증상이 비슷해도 환자마다 약효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리 모델링을 이용한 가상환자를 이용했다. 그 결과 약효가 달라지는 원인은 수면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생체시계 단백질인 PER2의 발현량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PER2의 양이 낮에는 증가하고 밤에는 감소해 하루 중 언제 투약하느냐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 환자마다 적절한 투약 시간을 찾아 최적의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시간요법을 개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성과를 통해 국내에서 아직은 부족한 의약학과 수학의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