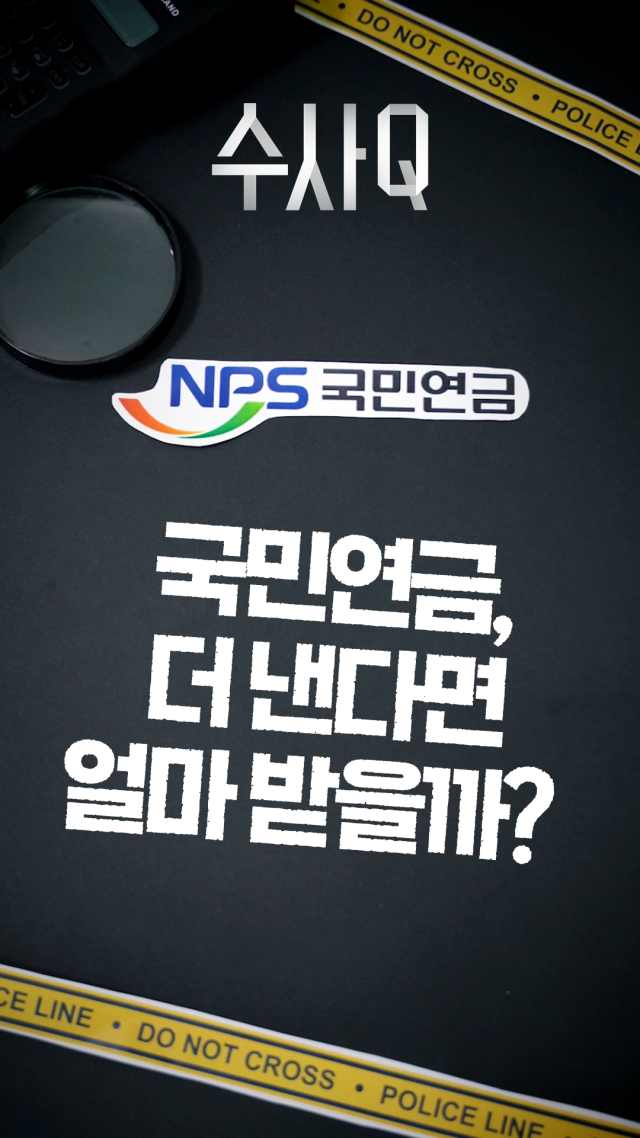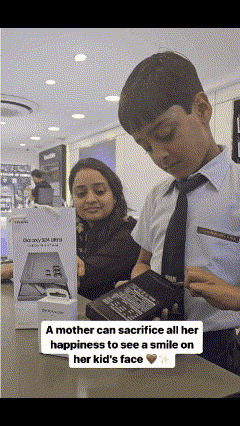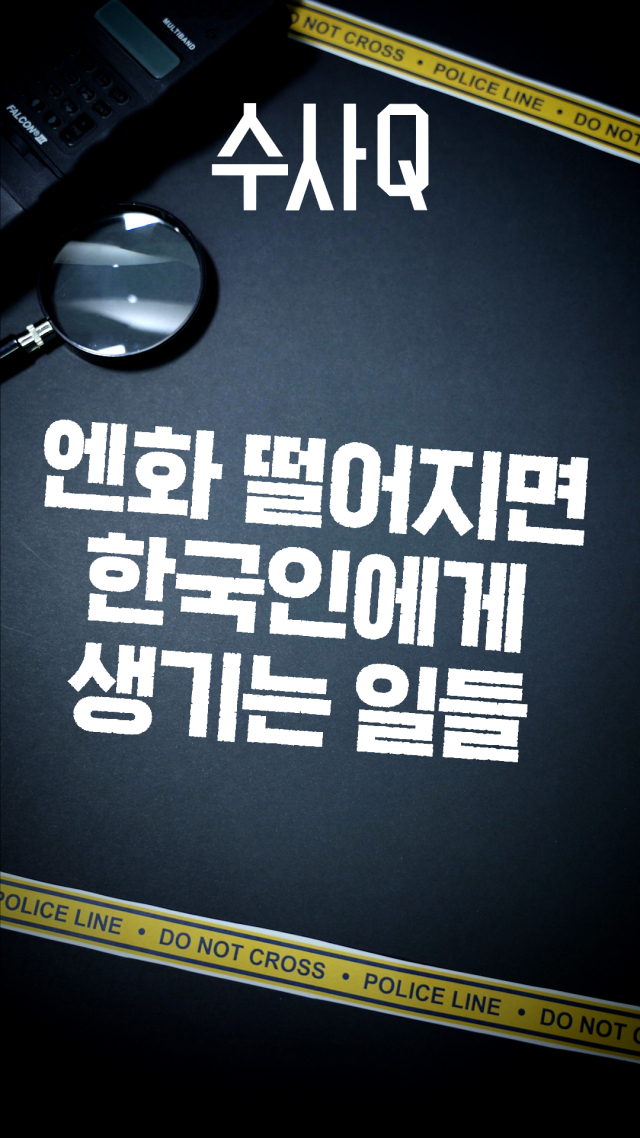“저희 회장님 일가가 이제 사고를 쳐도 보도 안 되는 것 맞죠?”
최근 기자와 만난 한 기업인은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쏟아내는 일명 ‘개혁’ 조치를 두고 “거물 정치인과 재벌만 무적(無敵)의 존재가 된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다.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피의사실 공표·공개소환 폐지 등으로 ‘인권 보호’ 혜택을 보는 건 소수의 특권층뿐이라는 투였다.
찬반 입장을 막론하고 기자에게 검찰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지인과 취재원은 한둘이 아니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는 과업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급박하고 중요한지, 왜 조 장관만 해낼 수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나아지는지 법조 기자랍시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답은 늘 “기자도 모른다”다.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권력의 시녀’로 지목된 검찰 특수부의 축소·폐지다.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평생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 현 정부 들어서도 특수부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위층만 겨눴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표적도 ‘개미’가 아닌 주가조작범 등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적극 흘리거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피의자 또한 고위공무원, 유력 정치인, 대기업 오너 같은 사람들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결정할 이슈다.
수많은 국민이 자기 삶과 거의 무관한 사안을 두고 생사가 걸린 듯 서로 치고받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0.1% 권력자들이나 다룰 규칙에 99.9%가 편을 갈라 대리전을 치르는 건 누구의 의중인가. 광장에는 “공수처로 검찰을 혼내줘야 한다”거나 “조국을 구속해야 한다”는 둥 뜬구름 잡는 외침만 울린다.
정부는 개혁 방향을 더 소상히 설명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부작용 가능성에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옳은 결과만 내놓는 만능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체제 변혁이 갈등을 무릅쓰고 경제·외교 위기 해결까지 제쳐 둘 정도로 다급하게 밀어붙일 사항인지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도 안 거친 정책을 독단적·경쟁적으로 국민에게 통보만 하는 법무부·검찰의 요즘 행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