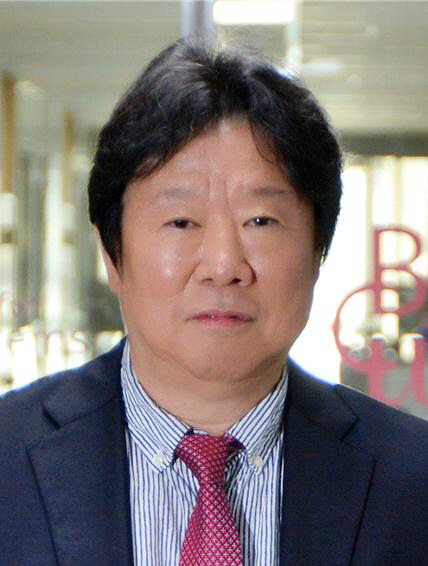매년 10월 초처럼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분야별로 어떤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는지에 주목한다. 올해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은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 교수로, 최초로 리튬이온전지 배터리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벨상은 무언가를 처음 발견 또는 발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독창성이 노벨상 수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노력과 동기가 부족하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기존 질서에 의문을 품어 질문을 던지고 결국은 이를 깨야 가능한데, 뿌리 깊은 유교사상은 이를 곱게 보지 않는다. 또 대단한 발견과 발명을 위해서는 장기간 연구에 집중하고 그에 대한 유연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연구 목적에 맞는지만 따지는 연구환경은 큰 걸림돌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환경은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에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노벨상 상금은 상마다 약 12억원이 주어진다. 보통 3명이 수상하며 주 기여자가 반을, 나머지 2명이 25%를 가진다. 세상에는 노벨상보다 상금이 많은 과학상도 많다. 저커버그 재단의 ‘브레이크스루상(Breakthrough Prize)’은 매년 총상금이 2,000만달러(약 235억원)로 각 수상자는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 받는다. 이외에 래스커상·튜링상 등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상도 많다. 래스커상 수상자의 50% 이상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노벨상 수상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릴 일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국내 ‘호암상’이 노벨재단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노벨상 수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 있다. 첫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교육환경 및 사회 분위기 형성이다. 노벨상 역대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약 30%에 달한다. 그들의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줄넘기를 잘한다’ 등 개별 학생의 개성과 장점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획일화되지 않은 교육의 방향성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이다. 어느 유명 과학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물었더니 “높은 천장의 실험실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구결과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셋째, 연구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는 여러 기술이 융합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연구가 더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연구수행 능력은 세계적 수준인 반면, 국제적 인지도는 생각보다 턱없이 낮다. 해외 기업, 연구소, 그리고 연구자와의 소통 및 협력연구가 적은 것이 큰 원인이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는 최소 30% 이상, 일본 이화학연구소(리켄·RIKEN)는 20% 이상의 과학자를 국외 연구자로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학과 연구소도 더 적극적으로 해외 학자와 인재를 영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도 본인의 세계에만 매몰되지 않게,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좀 더 널리 해외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대한민국은 큰 생채기를 입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극복할 의지와 동기를 부여했으며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과학은 올해도 노벨 수상자를 배출해냈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부럽게만 바라보는 우리의 처지가 처량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본보기로 삼아 국가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에 도전하게 될 때, 이는 대한민국 과학의 수준을 높이는 자극과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