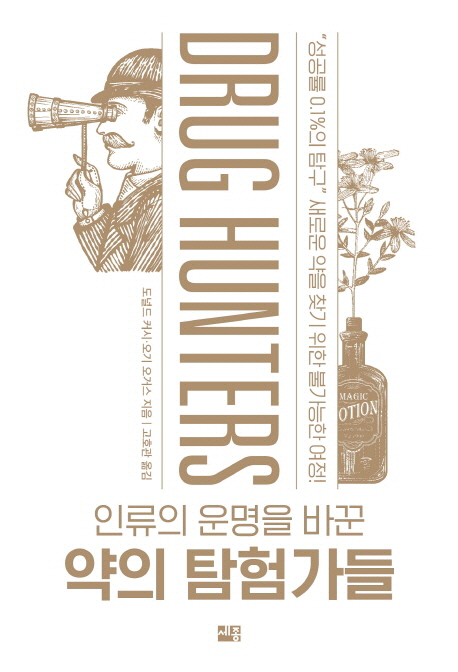지난 1991년 알프스 산맥 빙하에서 기원전 3,300년 경의 남자였던 미라 ‘아이스맨 외치’가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외치’의 내장에서 편충에 감염된 흔적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가 가죽끈으로 묶어 지니고 다니던 소지품 중에 자작나무 버섯을 찾아냈다. 자작나무 버섯은 편충을 치료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약품 키트였다. ‘외치’의 버섯에는 약을 찾는 인류의 노력에 관한 단순하고도 확고한 진실이 담겨 있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동·식물에서 약을 찾아내기 위해 헤매고 다녔으며, 이들 약 탐험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약을 만들어냈다기보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운’으로 약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신간 ‘인류의 운명을 바꾼 약의 탐험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신약 발견은 우연과 운,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고 단언한다. 대형 제약회사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신약을 찾는 근본적인 기술은 5,000년 전과 똑같다. 끈질기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화합물을 조사하고 그중 하나라도 효과가 있길 바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형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평균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14년의 세월을 쏟는다는 통계는 신약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신약 개발이 성공할 확률은 불과 0.1%다. 페니실린, 아스피린, 인슐린 등 인류의 운명을 바꾼 약들은 그런 어려운 연구 과정을 거쳐서 실용화된 ‘꿈의 약’이다.
책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 이 새로운 ‘꿈의 약’을 우연히 발견해낸 인류의 역사를 흥미롭게 펼쳐낸다. 20세기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페니실린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한 계기로 발견한 물질이었다. 플레밍은 황색포도상구균을 양분이 담긴 접시 위에서 기르는 한천배지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연구실 창문을 열어놓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접시 안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침입해 온 곰팡이 주변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연구 끝에 이 곰팡이가 다양한 병원성 세균을 소멸시키는 것을 확인해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괴혈병 치료법을 발견한 것도 시행착오와 운의 산물이었다. 18세기에는 괴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혀 몰랐다. 단순히 부패하는 질병이니 황산 같은 산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스코틀랜드 의사인 제임스 린드는 괴혈병에 걸린 선원들에게 다양한 산을 주고 결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실험 결과 감귤류를 처방받은 선원은 완전히 회복했지만 다른 집단은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훗날 비타민C가 괴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신약 발견의 일화 외에도 아스피린을 발견한 유대인 화학자가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나치가 그의 독일인 조수를 최초 발견자로 둔갑시킨 사건 등 신약 개발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도 함께 녹아있다.
저자인 도널드 커시가 제약 산업의 최전선에서 35년 동안 일하면서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녹여냈다는 점에서 책의 내용은 더욱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다가온다. 저자가 일하던 제약사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놓친 에피소드, 엉뚱한 갯벌에서 온종일 생명을 구하는 미생물을 찾다 허탕 친 일화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책은 단순히 신약 탐험의 역사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저자는 거대한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따라다니기 쉬운 바이오 산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돈이 될 만한 신약 연구에만 뛰어드는 제약회사들을 꼬집는다. 신약 개발의 특성상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성공은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쟁, 흥정과 상술, 돈을 노린 불순한 의도,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 등 여러 요소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부실한 임상실험 등이 문제시되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신약 개발에 대한 저자의 신념은 확고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신약 개발이 인류의 건강을 개선 시킬 뿐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