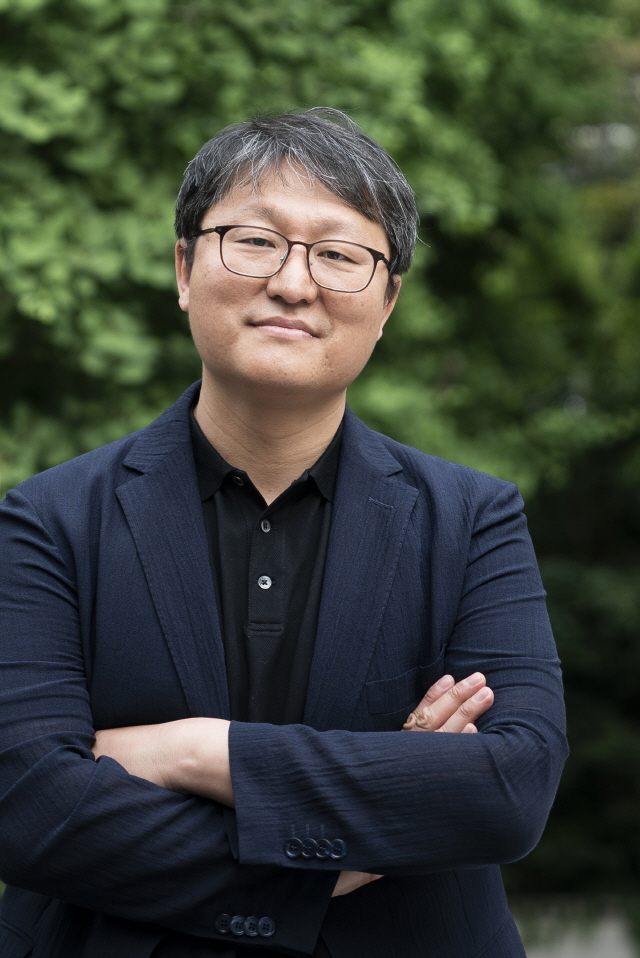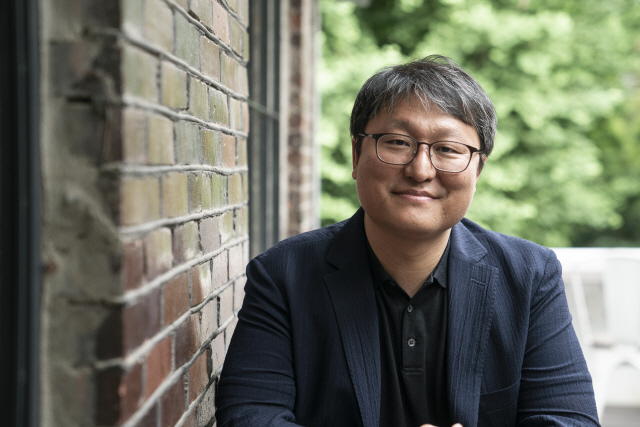1993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는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당시 청년은 대학교 3학년, 과제를 위해 ‘서편제’를 봤다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곧장 우리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이후 대회나 공연을 통해 우리 소리를 알리는데 앞장서왔다. 그리고 그는 30여년 만에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판소리를 영화화하는데 성공했다.
영화 ‘귀향’을 통해 범상치 않은 연출력으로 수많은 호평을 이끌어 낸 조정래 감독은 ‘소리꾼’을 두고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감개무량이라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영화다. 오랜 꿈이었고 저를 믿어주신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 무엇보다 전 작품 ‘귀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서편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인생도 없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지만 자퇴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방황했던 그에게 ‘서편제’는 운명과 같았다. 그는 ‘소리에 미친놈’으로 통할만큼 우리 소리에 애정을 갖게 됐고, 자신이 만든 판소리 동아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귀향’도 그때 본 ‘서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없었다.
“자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서편제’를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인지 감동인지 도저히 해석이 안돼서 영화를 몇 번이나 봤죠. 그리고 나서 ‘영화도 해야겠고 우리 소리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아리도 만들었는데 그때 후배로 들어왔던 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에요. 또 동아리에서 제일 처음 봉사활동 간 곳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었죠.”
‘귀향’이 그에게 사명 혹은 숙제와도 같은 영화라면 ‘소리꾼’은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영화였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잘 아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조정래 감독은 결국 좋아하는 일을 따르다 ‘소리꾼’에 이르게 됐다. 작품은 영조 10년 착취와 수탈, 인신매매로 정국이 어수선한 시기에 납치된 아내 간난을 찾기 위해 저잣거리에서 노래하는 소리꾼 학규를 중심으로 뭉친 광대패의 조선팔도 유랑기를 그린다. 대학 3학년 과제로 냈던 단편 시나리오 ‘회심곡’이 ‘소리꾼’의 단초가 됐다.
“대학 3학년 때 학규와 갓난의 이야기를 다룬 ‘회심곡’을 썼어요. 둘이 서로 의지하다가 결혼해서 늙어 죽기 직전까지 함께하는 내용이었죠. ‘소리꾼’은 소리가 주체이긴 하지만 모두가 주인공인 영화에요.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는 서사 자체가 진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이야기는 길 위에서 이뤄지는 가족의 복원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소리꾼 학규의 부인 갓난이가 납치되고, 갓난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학규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같이 청이를 돌보는 모습이 극의 맥락을 이룬다.
“언뜻 보면 다들 청이를 지키고 청이를 키우거나 업어주는데 가만 보면 청이가 이끄는 느낌이 있어요. 청이 때문에 사는 사람, 청이가 아니었으면 삶을 놔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요. 중의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연출 의도였어요.”
“삐뚤빼뚤한 돌이 껴 있어야 반듯하게 지어지는 전통가옥처럼 정의롭고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아요. 나보다 더 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과 어우러져서 살면서 의지하고 의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혈연으로 된 가족의 복원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나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듯) 귀한 인연인 것을.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조정래 감독은 ‘소리꾼’이 판소리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확신했다. 그는 날 것의 노래를 담아내고 싶어서 첫 스크린 연기에 도전하는 명창 이봉근에게 ‘지금부터 자네는 소리꾼 이봉근이 아니라 영화배우 이봉근이다. 판소리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리꾼의 전형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봉근 배우가 판소리의 전형을 구현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이 ‘소리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은 소리가 아닌 노래를 한다고, 소리는 예쁘게 노래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어우러진 것이자 인간의 몸을 통해 구현해 내는 거라고.’ 이봉근은 이미 숙련된 명창이지만 학규를 표현해내기 위해선 그걸 빼야하는 작업을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음악에서 오는 감동도 좋지만, 극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고전을 처음 혹은 다시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 민족이 음악을 좋아하고, 흥도 많고,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 한꺼번에 느꼈으면 했어요. ‘좋다, 행복하다, 또 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는 게 제 바람이고 의도였습니다.”
영화는 고전 ‘심청가’와 ‘춘향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조 감독이 두 고전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봤기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서편제에서도 기본 텍스트가 심청가였는데 심청가의 기원, 근원설화 등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심청가라는 텍스트 자체가 단순히 효와 효녀 심청이 희생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시대 눈 먼 딸이 있는 광대가 딸 대신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죠.”
“이야기 속에 대신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일종의 죄의식이 반영됐다고. 심청가 속 심 봉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이야기가 해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리꾼인 학규의 소리가 완성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죄의식과 바람 등 모든 것들과 화해하고 만나서 드디어 눈을 뜨는 깨달음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정래 감독은 ‘귀향’, ‘소리꾼’을 잇는 다음 작품 ‘아이누’를 준비 중이다. 아이누는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 열도 등지에 분포하는 소수 민족을 말한다. 그가 일본에서 전국 대 도시를 다니며 ‘귀향’을 상영할 때, 홋카이도에 강제징용으로 숨진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됐다.
“원래 아이누족의 땅인 홋카이도에서 조선인을 포함해 강제징용으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일본인들은 이들의 유골을 흙으로 덮어버렸죠. 아이누 족은 동물 취급을 당해서 대부분 학살당하거나 유골이 전시 취급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조선인 아이들을 데리고 키웠어요. 다음 작품은 그 과정에서 조력했던 수많은 일본인들과의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가능하면 한국에 유명한 감독님과 일본의 유명한 감독님 협업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