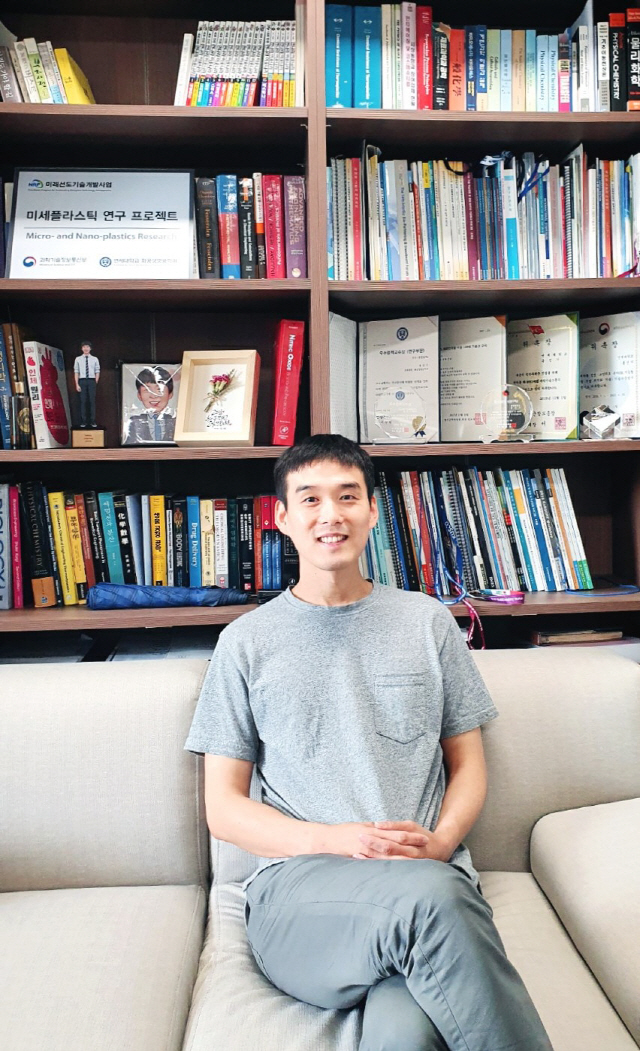“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줘야 합니다.”
홍진기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와 만나 “우리가 앞으로 플라스틱을 전혀 쓰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만으로도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나노 복합소재를 바이오 의료, 환경 및 소재 독성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 그는 “고분자 구조체를 의료 쪽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다가 질병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미세플라스틱이 세포에 쌓이다 보면 암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4~5년 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야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그 영향은 곧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1900년대 초중반 인류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생산한 뒤 땅에 묻은 것이 침식되고 작아져서 지하수로 스며들었다”며 “이것이 바다에 흘러가 다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 편리성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문제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조건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58도±2 환경에서 6개월 안에 플라스틱이 90% 이상 분해되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의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은 ‘90%’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생분해성을 높이면 플라스틱으로서의 기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사용분야마다 생분해가 필요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땅에 직접 뿌리는 종류의 플라스틱은 높은 수준의 생분해성이 필요하지만 모아서 재활용하기 쉽다면 50%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정부가 플라스틱 종류별로 인증기준을 세분화해야 기업들의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50~60%만 생분해돼도 아예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 좋지 않겠느냐”며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내 업체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진단키트와 마스크 생산을 했던 것처럼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재앙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제품이 경쟁해 생분해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대처한 것처럼 반 박자 빠르게 움직여 기업이 대처할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