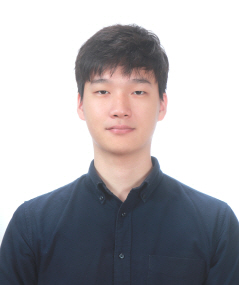지난 2019년 여름, 처음으로 검사를 만날 일이 있었다. 출입처 중 서울 소재 지검 한 곳을 배정받아 돌아다니다 첫인사를 나눈 자리였다. 그때 본 검사의 모습은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난 자신감·영리함 등이었다.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검사들은 달라진 모습이 더 보인다. 첫인상이 강하게 남아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진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인 일방통행에 검사들의 무기력함은 쐐기가 된 듯하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사실상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서다. 대검에 시간을 촉박하게 준 채 의견을 달라고 하고 법무부는 수정안을 만드는 시늉만 할 뿐 원안과 달라진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전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무부는 강행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는 인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도 실명을 내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검찰이 권력을 입맛대로 휘둘러왔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검찰이 세상 이슈의 중심이 되는 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이라는 한 검사의 말대로 검찰을 바꿀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무기력한 검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당장 60~70명의 검사들이 무더기로 경력 법관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일 잘하는 검사라는 후문이다. 조직원의 ‘엑소더스’는 조직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검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책임 있는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있을까.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을 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7일 야근하는 특수·공안부 검사들을 등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결과의 명분도 생긴다. 검찰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줘야 법무부도 검찰 개혁에 성공하고 반대편에 비판의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다.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