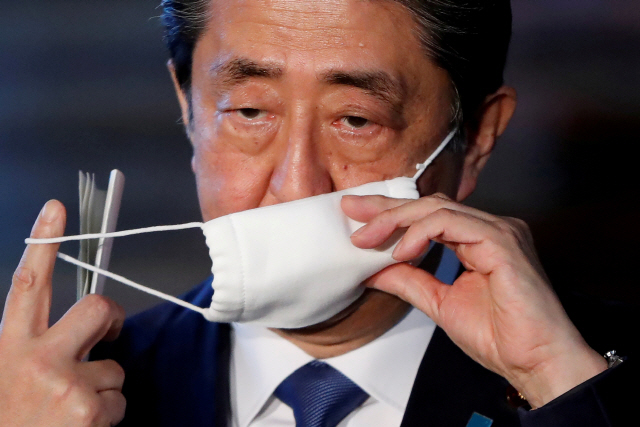“일본을 뒤덮는 불길한 공기가 이 나라를 점점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후퇴를 가속화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때리기’도 이런 불안한 사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소설가 나카무라 후미노리(中村文則)가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본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과도한 낙인찍기가 사회적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소설가는 지난 2005년 ‘흙 속의 아이’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으며 일본의 차세대 순문학 주자로 주목받았다.
"감염자 차별에 사람들 증상 숨겨"
나카무라는 일본인이 바이러스 등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심이 강한 나머지 더욱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감염자에 대한 공격에 눈이 멀어버려 ‘정말로 봐야 할 것’을 간과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나카무라는 “동아시아에 속한 일본은 대만이나 한국, 뉴질랜드와 같이 (바이러스를) 억누르는 게 가능했다”면서 “이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다른 나라를 찾아내 ‘일본은 굉장하다’고 하는 풍조는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전혀 대단하지 않다.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인근 대만 등과 비교해 보도해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을 '밤 거리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양분"
나카무라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지금까지 몇번이나 감염 확대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면서 “호스트클럽이나 캬바레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곳 종사자 전원을 검사했다면 시중 감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밤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양분해 검사를 억제했다”면서 “이 때문에 감염자는 곧 밤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굳어지면서 감염의 악순환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개인 공격보다는 정부 정책에 관심을"
나카무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개인에 대한 낙인찍기는 심화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었다면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격차 사회에서는 힘들다”면서 “갈수록 경기는 침체되고 사회도 침체돼 간다. 차별과 격차도 훨씬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올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환산 기준 27.8% 역성장하며 2차 대전 이후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