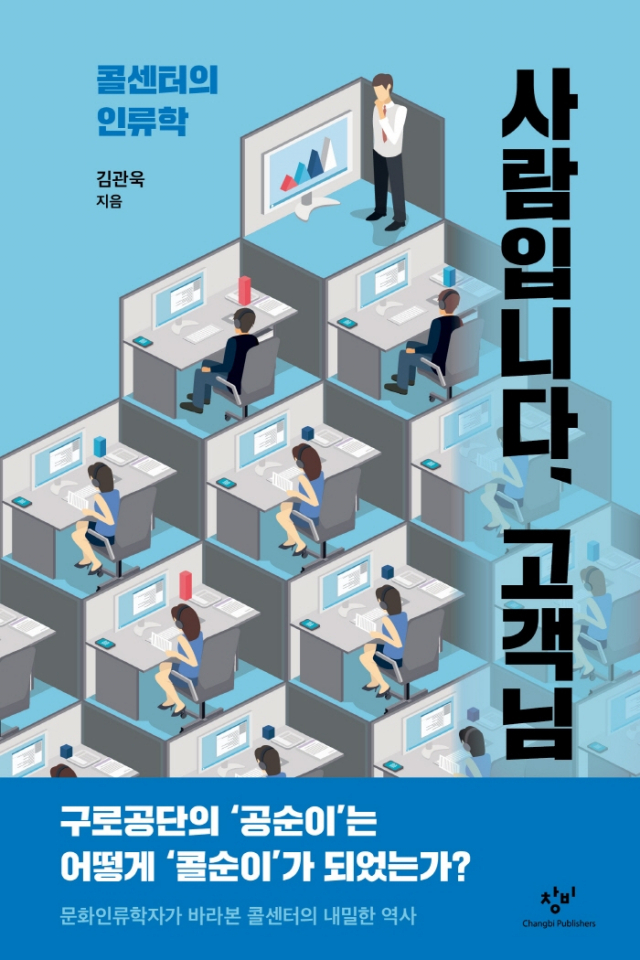“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듭된 사과에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민원인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든다. 마침내 통화가 끝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생각나는 건 오로지 담배 뿐이다. ‘닭장’ 같은 사무실을 빠져나와 건물 옥상으로 향한다. 연기를 내뿜는 건지, 한숨을 내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천국이다. 하지만 불과 4분짜리 천국이다. 조만간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또 해보지만 민원인의 ‘욕받이’ 노릇을 한 직후 옥상에 올라가면 떠오르는 선택지는 둘 뿐이다. 뛰어내릴 것인가, 피울 것인가.
신간 ‘사람입니다, 고객님’은 콜센터 근무 여성들의 유독 높은 흡연율에 관심을 갖게 된 의료인이자 문화인류학자가 이 문제를 역사적·경제적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연구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콜센터 상담사들을 만나 인터뷰해 온 김관욱 덕성여대 교수는 그 동안 숱하게 받은 “왜 하필 콜센터를 연구하나요”란 질문에 “낮은 임금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이들의 건강을 조금씩 빼앗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고정 관념마저 재생산하고 있다고 느끼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연구의 시작점은 서울 구로다. 50여 년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입이라도 하나 덜기 위해 상경한 10대 소녀들이 카페인 각성제를 비타민처럼 먹으며 밤새 재봉틀을 돌리고, 부품을 조립했던 곳이다. 다치거나 몸이 망가져도 그게 산업재해인 줄 모르고,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일했던 바로 그 곳이다. 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몸 바쳐 일한 덕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구로는 굴뚝 공장 대신 고층 건물이 즐비한 ‘디지털단지’로 변모했지만 구로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른다. 피로와 우울함에 찌든 ‘공순이’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표정을 꼭 닮은 여성들이 매일 아침 빠른 걸음으로 구로로 모여든다. 그들은 스스로 ‘콜순이’라 부른다.
일터의 풍경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봉 테이블 대신 모니터와 전화기를 갖춘 작은 칸막이 책상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했던 공단세대처럼 콜센터 상담사들은 밀려 드는 전화 때문에 생리 현상을 참으며 신경안정제를 삼킨다. 이렇게 과로를 해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 역시 공단세대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을 괴롭히는 건 악성 고객 만이 아니다. 회사의 실적 압박, 물리적·전자적 감시 시스템, 서로 불신하고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경쟁 분위기 조성 등이 더 큰 문제다.
여기에 코로나 19의 급습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일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김 교수는 정부 업무를 하청했던 한 콜센터의 상담사 사례를 소개한다. 팬데믹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 마스크’,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상담까지 긴급 업무가 줄줄이 한꺼번에 추가됐다. 콜센터로 끝도 없이 상담·민원 전화가 쏟아졌다. 우왕좌왕한 건 정부 대책이었지만 민원인들의 ‘욕받이’가 된 건 콜센터 상담사들이다. 한 상담사는 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무분별한 교육자료 배포에 정리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들이 많았다. 그래서 전부 상담사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상담을 했다. 재택근무자 중 한 명은 자녀에게 ‘엄마는 왜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매일 죄송하다고만 해? 뭘 잘못한거야?’라는 질문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했다”고 말한다.
물론 사회가 이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상담사들 스스로도 체념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당한 처우에 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처우 개선의 길은 멀다. 김 교수는 ‘감정노동’이란 표현 만으로 부족하다며, 이들의 일을 ‘정동노동’이라고 지칭한다. 정동은 ‘만남이 있을 때 느끼고, 행동하고, 지각하는 몸의 능력’을 뜻하는데, 이 같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고통을 겪는 노동자란 뜻이다.
김 교수는 “수화기 너머에 ‘얼굴과 몸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여성 노동자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받고 부당한 노동 때문에 질병을 앓는 이웃이 없는 사회가 오길 꿈꾼다”는 바람을 전한다. 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