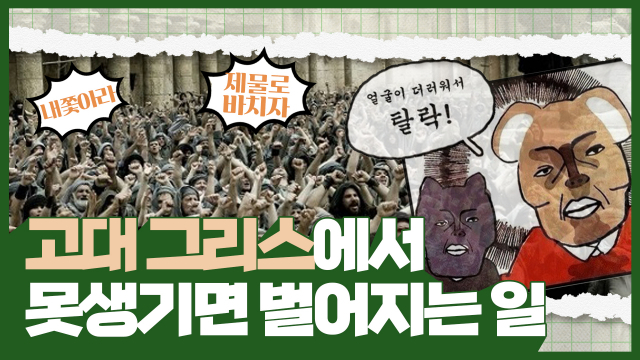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옛 고대 그리스에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마을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있다. 심지어 못생긴 남성은 지역에 따라 음경을 일곱 번 맞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슬픈 운명을 가진 주인공은 바로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파르마코스(pharmakos)’로 불린 사람들이다.
‘못생김’, 인간의 신체적·이성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파르마코스는 그리스어로 ‘약’과 ‘독’이라는 뜻이다.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제대로 사용할 경우 약이 되고 오남용할 경우 독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널리 쓰이는 의미는 ‘희생양’이다. 따라서 파르마코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다룬 여러 문학 작품 등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간 희생양’을 가리키기도 한다. 종교적 의미로 신에게 바치던 ‘인간 희생양’을 가리키는 단어로 파르마코스가 쓰인 것이다.
파르마코스의 선정 기준인 ‘못생겼다’는 말은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못생겼다는 의미보다 포괄적이다. 장영란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는 “추하다는 게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며 “(단어의 뜻을) 추론했을 때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심성이 악한 사람이거나 나쁜 걸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못생긴 사람은 인간이 지닌 신체적·이성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못생긴 사람만 파르마코스로 뽑힌 건 아니다. 최혜영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어떤 사회는 노예나 범죄자를 파르마코스로 뽑기도 했다”며 “(프랑스 남부의) 마실리아(Massilia) 지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자원해서 파르마코스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장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 영향력 없는 인물이 주로 파르마코스가 되곤 했다.
부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 사용된 희생제도
파르마코스를 뽑고 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때로는 폭력을 가하기도 쫓아내기도 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시대상과 연관된다. 고대 그리스는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당시 많은 그리스인들은 자연재해와 역병, 기근 등 각종 재해를 해소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은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는 그리스 신화 내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Oedipus) 이야기에도 나타난다. 하루는 아테네의 북쪽에 위치한 테베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다. 오이디푸스는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부인이자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의 남동생 크레온을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보내 신탁을 들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죄를 지어 역병이 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이내 뾰족한 브로치로 자신의 눈을 찔러 시력을 포기했다.
오이디푸스가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시력을 포기하듯 고대 그리스인들은 원인을 모를 때 ‘희생양 제도’를 사용하곤 했다.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평론가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이를 ‘초석(礎石)적 살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위기에 빠진 집단을 구하고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무고하고 연약한 희생양을 택해서 집단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파르마코스’ 문화
‘인간 희생양’ 파르마코스는 그리스의 폴리스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재 터키의 일부인 콜로폰(Colophon)에서는 매년 추한 남녀를 대변하는 인물을 뽑아 무화과, 보리수프, 치즈를 마구 먹이는 ‘호사’를 베푼다. 며칠간의 만찬이 끝나면 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났다. 특히 남자는 음경을 일곱 번 맞고 추방됐다.
현재 그리스의 북동쪽 동마케도니아 트라키아주 크산티현에 위치한 압데라(Abdera)에서는 불쌍한 악마를 사서 무화과를 비롯한 여러 음식을 잘 먹였다. 그러고는 지정된 날 도시 성벽 밖으로 끌고 나와 돌을 던지며 국경 밖으로 추방했다.
아테네(Athens)에서는 파르마코스에게 무화과나무로 만든 화관을 씌웠다. 이후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여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타르겔리아’라는 농업 축제에서 파르마코스를 추방하며 마을의 새 출발을 도모했다.
파르마코스 문화에서는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과일 무화과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무화과가 그리스 문화권 내에서 통상적으로 ‘정화’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추론하건대 무화과는 씨앗이 많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며 “고대 사회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서 무화과나무를 사용해 역병과 가뭄이 사라진 풍요로운 사회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결국 파르마코스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된 인간 희생양이다. 세속의 악한 것들을 짊어지고 떠나기 위해선 적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몰아내기 쉽다. 따라서 추하고 못생긴 사람을 파르마코스로 뽑아 결과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파르마코스는 당시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