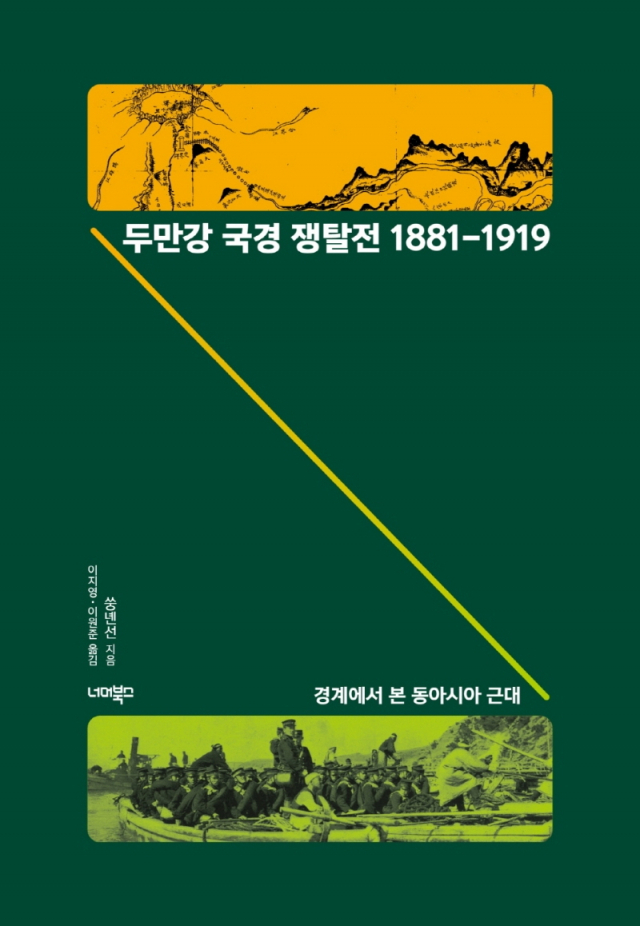‘국가가 국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경이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다’
역사학자인 쑹녠선 중국 칭화대 교수가 신간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저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두만강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이 국민과 국가를 새롭게 정의하며 근대 국가로 거듭났다고 지적한다.
당초 두만강 너머 간도(연변) 지역은 영토 분쟁을 겪는 땅이었다. 1712년 조선과 청은 국경인 두만강과 압록강의 분계를 표시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을 경계로 정했다. 문제는 토문강이 두만강인지, 해란강인지, 송화강인지 불분명했다는 점이었다. 두만강으로 정하더라도 산림의 물줄기가 복잡해 진짜 수원을 찾기가 어려웠다.
청과 조선은 1880년대 두 차례 국경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영토 분쟁은 두만강 북쪽으로 이주한 수많은 조선인 이주민에 대한 통치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는 문제와도 결부돼 있었다. 또 간도는 일본과 러시아도 두만강 지역이나 만주 전체에 눈독을 들이면서 신구 강대국의 싸움터가 돼 있었다. 결국 국경은 1909년 당사자인 조선은 빠진 채 청일간 타협으로 결정됐다. ‘간도협약’을 통해 두만강 가운데 물줄기인 ‘석을수’를 경계를 정하는 청의 타협안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대신 철도 부설, 탄광 개발 등 만주의 수많은 이권을 보장받기로 한 것이다.
간도를 둘러싼 한·중·일간 갈등은 궁극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경쟁이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지역의 통치력 강화를 위해 관료제, 치안 유지, 공교육과 공공의료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근대적 국가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연변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면 동북 3성도 내부로 묶어둘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일본은 이 지역을 ‘무인 지대’, 즉 버려진 황무지라고 주장하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주의 국가 건설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
한국도 일제에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두만강 북쪽 간도 지역을 민족주의 결집의 정신적 공간으로 민족국가를 세우려 했다. 즉 중국의 ‘내지화’와 일본의 ‘식민화’, 한국의 ‘독립’이라는 세 종류의 각축전 속에서 국민·국경·국가·영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넓지도 않은 변경지대에서 발생한 충돌과 담판, 타협에는 심각한 지구사·지역사적 의의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