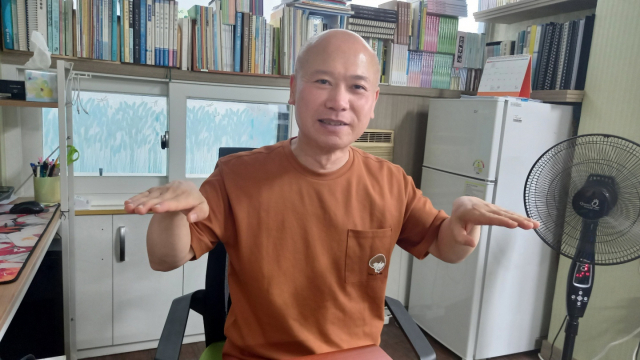한밤중 갑자기 박정근(56·사진) 한국수화통역사협회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병원을 찾은 청각장애인이 급하게 걸어온 전화였다. 내용인즉 배가 너무 아픈데 수술을 해야 하는지 물어봐 달라는 것이었다. 의사는 수화를 모르고 청각장애인은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결국 박 회장이 의사와 농인의 의사를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하면서 겨우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내게 연락이 안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식은땀이 흐른다”고 당시의 긴박함을 전했다.
34년간 청각장애인을 위해 살아온 박 회장에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인들의 유일한 소통 수단은 수화다. 불행히 비장애인 중 수화가 가능한 이는 극소수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니 병원에 갈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야말로 비상사태일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이 항상 대기 모드로 지내는 이유다.
직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완성차 업체의 공장으로 출퇴근을 한다. 보통 직장인과 다른 점이라면 직장이 생계비 확보 이상의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업은 수화 통역이다. 박 회장이 직장에서 잔업이나 특근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다. 그래도 그가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가 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다. 그는 “직장 때문에 수화 통역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직장을 포기했을 것”이라면서 “동료들의 배려에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며 감사를 표현했다.
수화는 2016년 우리나라 공용어로 지정됐다. 국어와 동등한 언어라는 뜻이다. 달라진 게 있을까. 박 회장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은 여전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할 때 수화 통역사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뿐이다. 다른 분야에서 실시간 기자회견을 할 때는 수화 통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방송에서 잘려서 나오기 일쑤다. 그는 “제도는 있는데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없으니 농인들이 화만 더 낸다”며 “기대에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친다”고 평가절하했다.
수화 통역의 부재는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단절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초래한다. 수어는 한정돼 있기에 전문용어들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30세대가 쓰는 말 중 농인들이 아는 단어도 거의 없다. 젊은이들은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수화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는 “가끔 농인들이 뉴스를 보다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는 한다”며 “우리에게 쉬운 것들도 그들에게는 문화의 단절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근 발달장애인 변호사를 소재로 해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를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농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다.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고 싶어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다. 교육은 그들에게 넘기 힘든 장벽이다. “농학교에 수화 통역 자격증을 갖고 오는 교사는 10%가 채 안 돼요.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농학교가 이러한데 일반 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농인을 위해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있다. 그렇다고 이 대학이 농인들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대나 의대 같은 곳은 이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수화 통역이 이뤄지지 않기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오죽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농인들에게 ‘불쌍하다’는 표현하고 다닐까요.” 그의 한탄이다.
박 회장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 대통령이 연설할 때 수화 통역을 같이 했으면 하고 이를 방송에 같이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수화 통역을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함이 담겨 있다. 그는 “수화 통역은 일부러 세운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힘 있는 곳부터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면 농인들도 보다 나은 세상을 살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