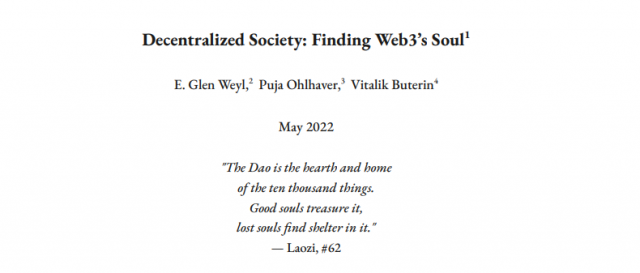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 창시자가 거래 불가 대체불가토큰(NFT) 개념을 제시했다. 이른바 소울바운드토큰(Soulbound Token, SBT)인데 현재 디지털 신분증 기술인 분산ID(DID)를 대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부테린은 지난 5월 글렌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 푸자올 하버 플래시봇 전략 고문과 공동으로 ‘탈중앙화 사회: 웹3.0의 영혼을 찾아서(Decentralized Society: Finding Web3’s Soul)’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웹3.0 사회적 정체성 부족…웹2.0에 의존하는 한계
이들은 논문에서 경제적 교환 행위는 사람 간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되지만 웹3.0에선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중앙화된 웹2.0 구조에 의존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NFT 아티스트 대부분은 오픈씨, 트위터 등 중앙화 된 플랫폼에 의존한다. 많은 웹3.0 참여자는 코인베이스, 바인내스 등 중앙화 거래소가 제공하는 지갑을 사용한다.
NFT 기술은 기존에 온라인상에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무형 자산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인류 최초의 기술로 손꼽힌다. NFT라는 디지털 세상의 소유권 증명 수단이 등장하면서 메타버스 내 경제 생태계가 꾸려졌다. 그러나 생태계 기여자 보다 돈이 많은 자에게 NFT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웹3.0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SBT, 이전 및 거래 불가 NFT…인증 간편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나온 아이디어가 한번 받으면 재전송이 불가능한 NFT인 SBT다. 이 개념은 유명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의 아이템 소울바운드에서 유래했다. 소울바운드 아이템은 한번 얻으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SBT는 지갑에 귀속돼 다른 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고, 거래도 할 수 없다. 즉 NFT에 ‘영혼(soul)’을 부여해 정체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SBT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다오) 등 웹3.0 생태계뿐 아니라 학위, 인증서, 주민등록증 등 실생활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기관이 졸업자에게 학위를 SBT로 발행하면 손쉽게 인증이 가능하다. 필요할 때마다 졸업증명서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주민등록증 등 현실 세계에서의 신원 확인도 국가 기관이 나서 SBT로 발행하면 인증이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ID와 기능 유사…웹3.0·현실세계 인증 수단으로 대체 가능성
이 같은 기능은 앞서 등장했던 DID(Decentralized Identifiers)와도 유사하다. DID는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로, 발급된 DID 하나만으로 여러 기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DID에 신뢰를 부여하는 기관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장벽이 있어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을 주축으로 결성된 이니셜 DID 연합을 비롯해 라온시큐어 주도한 DID 얼라이언스, 아이콘루프가 이끈 마이아이디얼라이언스, 코인플러그가 출범한 마이키핀얼라이언스 등이 나왔지만 대중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SBT는 개념상 발행이 간편하고, 누구든 SBT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기에 발행기관의 권위만 입증되면 SBT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다. 향후 SBT가 DID를 제치고 웹3.0과 현실의 디지털 정체성 증명 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는 이유다.
다만 SBT는 아직 개념이 제시된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실질적 사용 사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SBT의 미래는 아직 백지 상태”라면서도 “SBT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커뮤니티에게 진정한 영혼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 사회 운동의 기본 요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