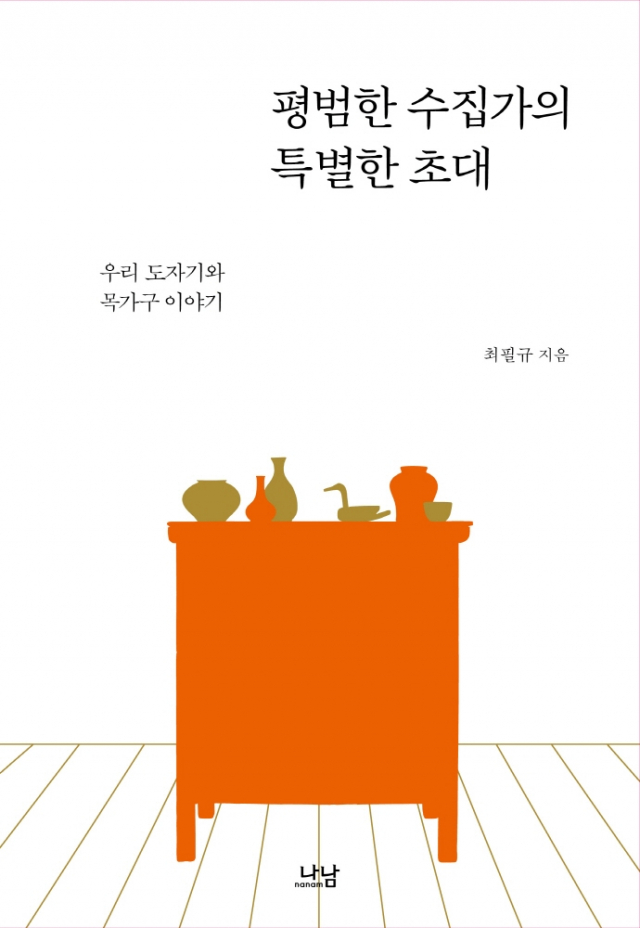“고미술·골동품의 세계는 일보일경(一步一景)입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납니다.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옛것이되 오늘의 것이며, 나아가 미래에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의 총칭입니다.”
알면 보이고 자꾸 보면 사랑하게 되니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30년 동안 고미술에 몰입한 최필규(사진) 한성대 특임교수의 얘기다. 언론인 출신으로 현대그룹 홍보실장과 태광실업 그룹 부사장 등 기업인의 삶을 살면서 업(業)은 바뀌어도 애호(愛好)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그의 새 책 ‘평범한 수집가의 특별한 초대(나남 펴냄)’가 탄생한 배경이다.
최 특임교수는 “13세기 고려 유물로 추정되는 청자 유병(油甁)을 이리저리 매만지며 도공의 마음을 헤아려보다가 유병 상부의 새 네 마리가 장욱진의 ‘자화상(1951)’ 속 까치 네 마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날아가고 싶은 도공과 장욱진의 마음이 시간을 넘어 포개진 것일까 싶었다”고 말했다. 청자의 상감기법을 보면서는 골동품 사랑이 남달랐던 이중섭을 떠올렸다. 책은 담뱃갑 속 은지에 음각 드로잉을 한 후 잉크를 채운 이중섭의 은지화와 고려 상감청자를 나란히 보여준다. 조선의 순백자를 소개하면서는 백자 사랑이 극진했던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를 함께 실었다. 삼성가(家)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작품이다.
그는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자 산업 전쟁이었고 당시 도자기는 지금의 반도체에 해당한다”면서 “1300도의 가마에서 흙이 금속처럼 단단한 도자기로 변화하는 16세기 도자기 생산 기술은 첨단산업의 전부였고, 유럽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독일이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자부심을 강조했다.
저자는 1990년대 초 홍콩 특파원으로 발령 나면서 동서 문물의 보고인 현지 골동품 가게를 즐겨 다니며 고미술에 눈을 떴다. 베이징 특파원 생활은 “가장 중요한 진위 여부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며 안목을 높여줬다. 밖에서 익힌 안목이 우리 것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는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예술품은 감동으로 다가왔으나, 비교하면 할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외국 것은 버리고 우리 것만 찾게 됐다”고 고미술에 빠진 이유를 소개했다.
책을 쓴 이유는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다. 그는 “우리 고미술 안내서를 보면 기법에 집중한 학술서 위주일 뿐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자동차 애호가들이 포르쉐나 벤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연한 곡선미와 색상 같은 디자인적 측면인데 우리는 우리 공예품의 미감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미술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책은 목가구와 도자기에 집중했다. 저자의 소장품이 대부분인 유물 사진이 보는 맛을 더한다. 거실 탁자 대신 사용하는 여러 개의 소반을 로얄코펜하겐 찻잔과 함께 배치한 사진은 “우리 고미술이 서양식·현대식과도 어우러는 것을 통해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30년간 수집한 것 중에는 싼 값에 샀지만 지금 비싸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강소 화백의 ‘오리’를 닮은 나무기러기(木雁), 실생활에 사용됐던 떡살 같은 것들이 미학적 측면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로워야 고미술을 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누구나 평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수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시작해보시죠.”